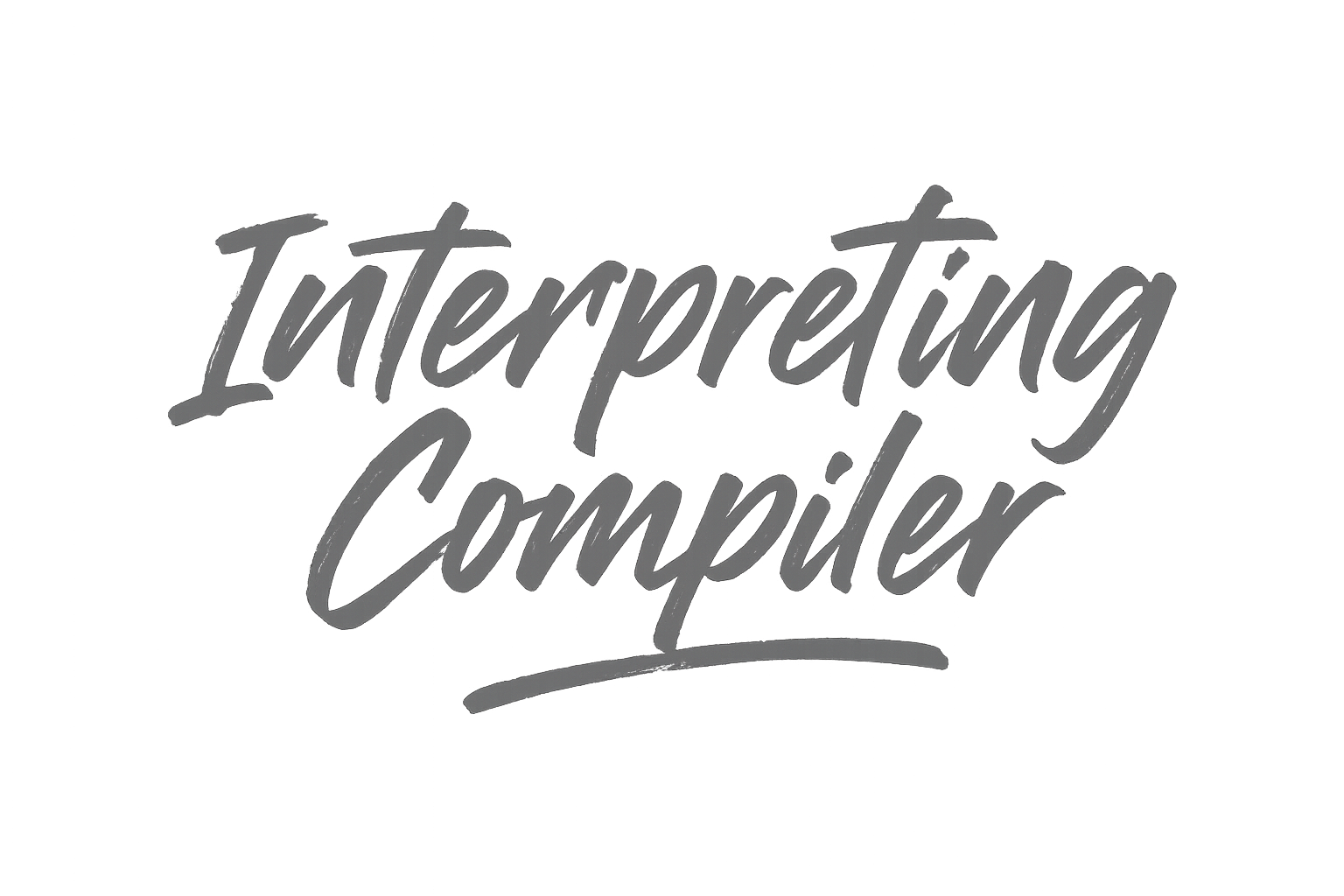10년
by 김상훈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어린 시절부터 애플 제품을 썼던 건 아니다. 물론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가 흔히 볼 수 없는 값비싼 기계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옆집 형이 갖고 있던 애플II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그냥 그 정도였다. 이후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고, 그가 만든 넥스트 큐브가 용산전자상가에 한 대 전시돼 있어 보러 갔던 기억도 난다.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또한 가격표 때문이었는데,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던(90년대 초에 국내 소비자가격이 900만 원 대였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부정확함) 가격이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아직도 만져보지도 못하게 유리상자에 담겨 전시되던 그 넥스트 큐브가 눈앞에 어른거릴까. 그러니까 내게 애플은 늘 닿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럭셔리 브랜드였다. 일종의 여성들의 샤넬백 같은 존재랄까.
그게 달라진 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난 뒤 곧바로 내가 했던 일이 바로 다음달 월급까지 미리 끌어당겨 쓸 수 있는 마법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아이팟을 산 것이었다.(사실 수습기간 월급은 매우 박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한턱 내고 나서 뒤돌아보니 아이팟은 다다음달 월급을 끌어당겨 샀던 셈이었다.) 어쨌든, 애플에서 만드는 액세서리가 아닌 손에 쥘 수 있는 첫 제품이 '살만한 가격' 수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팟을 사고 나니 아이맥을 사게 되고, 아이맥을 사고 나니 들고다닐 맥북이 필요하고, 그러다 아이폰이 들어오니 아이폰도 쓰고, 아이폰이 괜찮으니 아이패드도 사고 등등...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주위 사람들이 무슨 글을 안 쓰느냐고 부추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년이 지났을 때도 별 얘기를 쓴 게 없는데(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스티브 잡스보다 내 인생에 최소한 만배는 더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생판 남에 대해 내가 무슨 추도문까지 쓰겠냐 싶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한 마디는 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업적을, 그것도 세컨커밍, 그러니까 1997년 이후의 성과를 그저 아이맥과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의 발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젊은 시절의 스티브 잡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내 생각에 1997년 이후의 스티브 잡스가 이뤄낸 가장 큰 혁신은 샤넬백을 코치백 가격에 판매한 일이다. 소수의 럭셔리 제품을 만인을 위해 만들어낸 일.
그러니까, 난 아이폰5도 나오자마자 곧장 달려가서 살 생각인데, 아마도 그건 내겐 쏘나타 가격으로 SL55를 사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