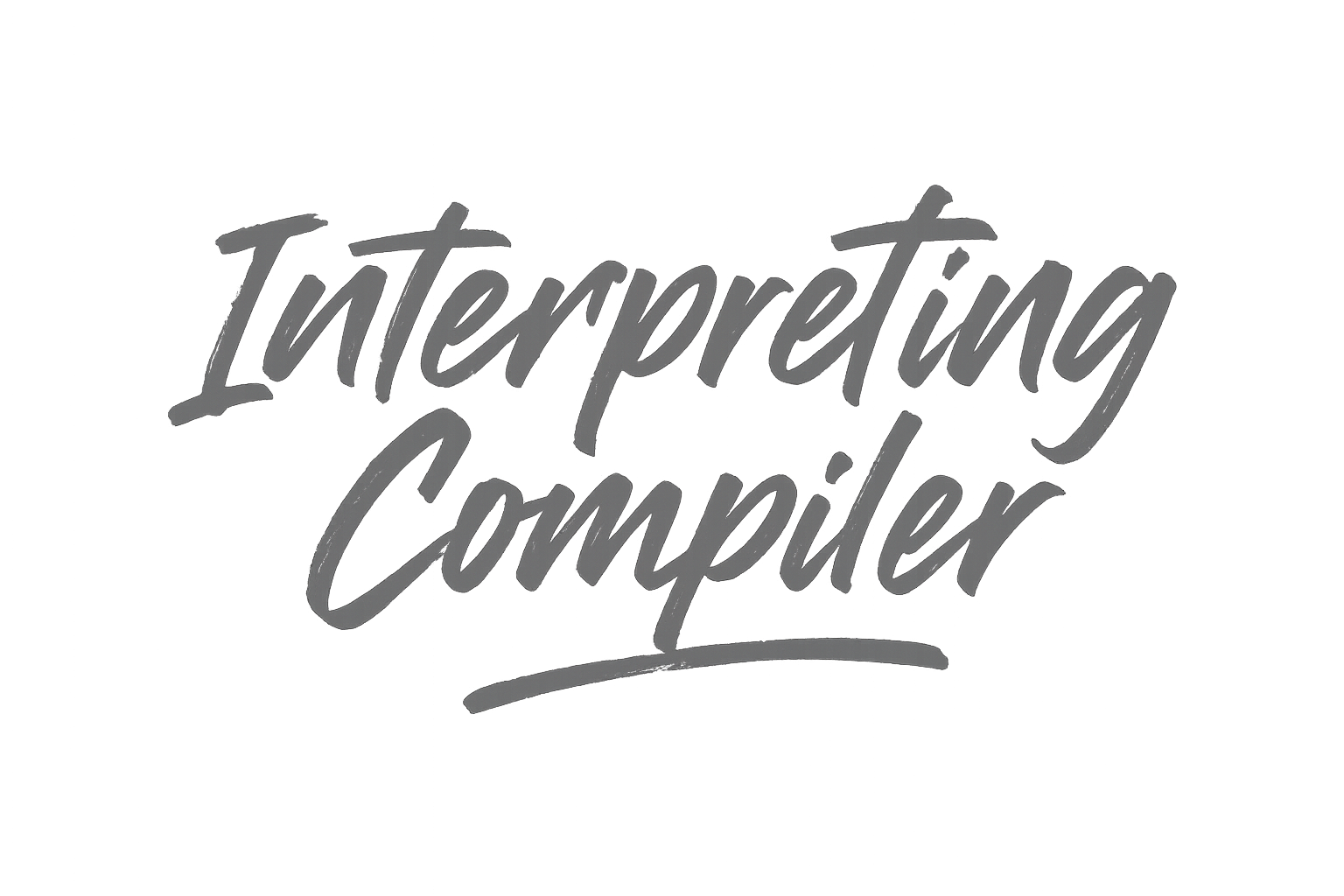아이패드에 대해 미처 못 한 얘기들
by 김상훈
아침에 일어나서 외신 확인하고, 아이패드 기사를 쓰겠다고 데스크에게 보고하고 애플 홈페이지에 올라온 스티브 잡스 키노트를 보고, 점심 먹고, 기사 쓰고, 수정하고... 그러고 나니 하루가 끝났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와 볼 시간도 별로 없었네요. 제가 쓴 아이패드 기사는 그럭저럭 잘 나갔지만 지면은 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뭔가 쓸 말을 덜 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조금 덧붙여 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이패드를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아이폰'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카메라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숫자키패드와 작은 LCD화면이 달린 전용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용해 가방에 아이패드를 넣고 블루투스 헤드셋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전화기처럼 쓰고 인터넷을 쓰려면 아이패드를 꺼내는 장면 같은 걸 상상했는데, 아이패드는 음성통화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넷북과 태블릿PC의 경쟁제품이라면서도 자체 완결성을 가진 경쟁 기기와는 달리 여전히 컴퓨터에 싱크를 해야 하는 약간 어정쩡한 제품인 것도 이상했고요.
리앤더 카니의 글을 읽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건 나를 위한 제품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를 위한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리앤더 카니는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스티브 잡스와 애플에 대한 책을 몇 권 쓰고 와이어드 편집자이기도 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조금 바이어스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문가죠. 그는 아이패드를 본 자칭 IT 전문가들의 수많은 혹평에 약간 놀랍니다. 카메라도 없고, 1GHz 속도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쓰면서 멀티태스킹도 안 되고, 여전히 플래시 동영상이나 게임은 안 돌아가는 기계라며 전자제품 좀 써봤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를 외쳤으니까요.
카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패드는 저 사람들을 뺀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라고요.(the computer for the rest of us) 그러니까 저처럼 매번 새 전자제품을 사들고 와 전선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신기하지?"라고 자랑스러운 듯 웃는 사람을 한심하게 여기는 제 아내나 제 어머니도 놀라운 현대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컴퓨터란 뜻이죠. 8개월 된 제 아들이 처음 만져보면서도 아무런 사용설명서도 보지 않은 채 그림만 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란 뜻이고요.
'컴퓨터를 쓴다'는 건 그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찾아가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했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컴퓨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읽기도 힘든 한국어같지 않은 한국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강요하고, 시키는대로 하다보면 어느 날 바이러스에 감염돼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 직원을 불러야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하라거나, dll 파일이 없어졌다거나, 얘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혔죠.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켜고 끄는 데 시간은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컴퓨터는 왜 밥솥이나 믹서기처럼 전원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전원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여기저기 클릭해야만 하는지 등등...
아이패드는 이 모든 걸 바꾸는 컴퓨터입니다.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문서작성도 할 수 있으며, 프레젠테이션과 엑셀 작업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쓸 수 있으니 포토샵 작업과 그림그리기, 음악 만들기까지 가능하죠. 아이콘을 클릭? 그냥 그림을 만지면 됩니다. 화면을 두드리면 되고요. 마우스보다도 쉽습니다. 게다가 전원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부팅시간 따위는 없죠.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모두 이 기계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값은 499달러, 제일 비싼 녀석이 829달러입니다. 속도는 같은 가격의 노트북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가전제품은 밥솥이겠지만, 미국인들은 토스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가리켜 '컴퓨터를 드디어 토스터 수준으로 쉽게 만들어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에서 보면 밥솥같은 컴퓨터겠죠. 아이폰을 써본 사람들은 매뉴얼 같은 것 없이도 바로 아이패드를 쓸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안 써봤다면 적어도 제가 흑백 휴대전화를 총천연색 삼성 애니콜로 바꾸고 나서 겪었던 혼란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만으로 아이패드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는 늘 훌륭하지만, 이번 키노트는 조금 더 가슴에 찡하게 와닿더군요. 키노트 말미에 얘기했던 '인문학'(liberal arts)과 기술 사이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애플의 모습이 발표 내내 느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절대로 어떤 해상도의 동영상이 재생된다, 음악 재생기능은 이렇게 뛰어나다,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애니메이션 '업'(Up)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주인공 칼과 엘리의 대사없는 시퀀스를 아이패드로 틀어서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에요"라고 한마디 하면서. 저도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맙다고 말하고 무대 뒤로 퇴장할 때는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이 30년 째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 정서에 동감할 겁니다. 애플은 굉장히 사람들 가까운 곳에 서서 편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기업입니다. 아, 저 기계로 동영상도 되고 음악감상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저걸 사서 소파에 앉아 '업(Up)'을 봐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죠. 그게 기술보다 그걸 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과 기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교보문고, 아이북스 스토어에 전자책 공급 않기로", "삼성전자, 아이패드 킬러 출시", "아이패드, 한국에선 인터넷뱅킹도, 방송사 다시보기도 할 수 없어" 등의 기사 제목들이 주루룩 연상이 됩니다. 미국 기업은 저기까지 발전했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