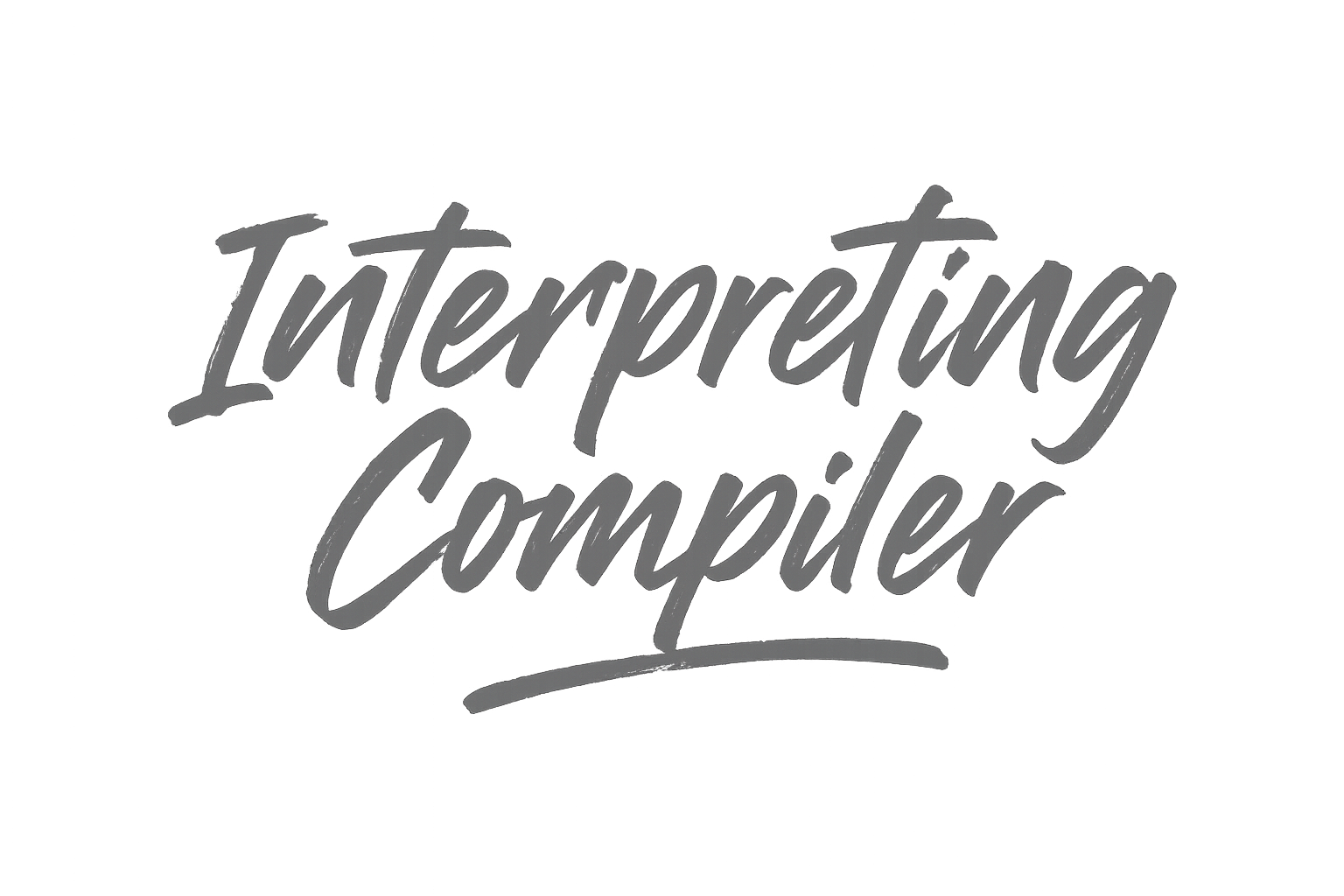더 써도 덜 쓴다 (4) 잠든 모든 것을 깨우다
by 김상훈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 산호세의 시내 2번가. 9월 25일, 세번째의 ‘테크숍’이 문을 열었다. 이 인근에서만 세번째였다. 카테리나의 셰어키친이 ‘프로들의 주방’을 갖지 못해 프로가 될 기회마저 박탈당했던 일반인을 위해 지어진 주방이었다면 테크숍은 ‘프로들의 공구’를 갖지 못해 프로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던 일반인을 위해 지어진 작업장이었다. 테크숍은 제품과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곳이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과거에는 스스로 지붕도 고치고, 농기구도 수리하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자전거나 자동차의 간단한 고장조차 직접 수리하지 못한다. 수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직접 쓰는 물건을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옷, 가위, 의자, 옷장, 자전거... 모두 직접 만들면 어설프고, 못 쓸 제품이 되고 마는 것들이었다. 기술의 부족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기술을 연마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 디지털카메라가 생긴 뒤로 아마추어도 전문가 못잖은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됐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 테크숍에서는 싼 값에 전문가들의 공구를 빌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대형 공장에서 갓 제작한 것 같은 잘 빠진 공산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매월 125달러의 회비. 테크숍의 회원이 되면 곧바로 대형 프레스와 레이저 절단기 등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모두가 자전거와 기계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는 건 아니다. 공업용 미싱을 쓰려고 테크숍에 회원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손으로는 만들기 힘든 복잡한 무늬를 자동으로 잘라내 레이스를 만들어주는 재단기 등이 테크숍이 갖춘 기계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면, 테크숍이 기회를 준다. 내게 테크숍을 안내해 줬던 직원 브라이언 마틴슨 씨도 테크숍에서 직접 화물용 자전거를 제작했다.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큰 짐을 싣기에는 짐칸이 너무 작고, 무거운 짐을 실으면 타이어와 휠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테크숍에 쌓여 있는 이 수많은 기계들을 '위 제너레이션'의 저자 레이첼 보츠먼은 ‘유휴 생산력’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전동 드릴 같은 생산도구 얘기다. 한 사람이 전동 드릴을 산다면 평생 동안 이 드리를 써서 작업을 하는 시간을 합칠 경우 채 30분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시간 동안 드릴이 하는 일은 집안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잠들어 있는 것 뿐이다. 이런 생산 수단을 공유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테크숍이 됐다.
이렇게 잠들어 있던 생산시설이 깨어나면 새로운 기업이 등장한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쉽게 창업한다는 건 지금까지 닷컴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테크숍 같은 회사는 이를 바꿨다. 이제는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됐다. 테크숍의 마케팅 디렉터 캐리 몬타메디 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쓰는 아이패드 케이스를 만든 ‘도도케이스’라는 회사가 테크숍을 이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설명했다. 도도케이스는 마치 양장본 책표지처럼 생긴 아이패드 케이스다. 양장본 책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플라스틱 대신 나무를 사용했다. 책이었다면 그저 잘라서 제본하면 끝이었겠지만, 오차라곤 찾기 힘든 알루미늄 아이패드를 감싸기 위해서는 나무도 그만큼 정교하게 자르고 가공해야 했다. 이를 제작하기 위한 필수 장비가 바로 약 2만5000달러짜리 나무 세공기계였다. 창업자 패트릭 버클리 씨는 테크숍을 이용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이 인기를 끌자 대량생산을 통해 약 50달러짜리 도도케이스를 100만 개 이상 팔았다. 물론 그 중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라갔다.
놀고 있는 유휴 생산력은 곳곳에 있다. 우리 모두의 집에 있는 세탁기는 어떨까. 부지런하면 매일 세탁기를 돌리겠지만, 23시간은 잠자고 있게 마련이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세탁기를 돌린다면 세탁기가 쉬는 시간은 훨씬 늘어난다. 브레인워시(brain wash)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세탁소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마켓스트리트 남쪽 폴섬가에 자리 잡은 브레인워시는 겉에도 '세탁소(Laundromat)'라고 써 있고, 안에 세탁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세탁소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 우선 분위기가 다르다. 브레인워시는 카페다. 세탁물을 맡기고 건조될 때까지 걸리는 1,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다. 누군가는 컴퓨터를 꺼내 일을 한다. 저녁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밴드의 공연이 열린다. 1999년 창업 당시만 해도 과연 이런 식의 세탁소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곳은 이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세탁소가 됐다.
사무실에도 쉬는 자원이 늘 있게 마련이다. 바로 책상이다. 직원들은 공간 부족을 호소하지만, 책상은 언제나 남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출산휴가를 떠나거나, 보름 동안 장기 출장이나 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있다. 누군가는 한 달 짜리 병가를 내기도 한다. 그 책상을 다른 직원에게 주려면 자리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늘 책상은 비고,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일주일, 또는 단 하루 동안 일할 책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루스큐브라는 회사는 세계 각지의 기업이 사무실의 빈자리나 작은 방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회사의 특징은 단순히 빈자리를 돈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사실 남의 회사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스큐브는 사무실을 빌려주면서 돈 대신 노동력을 요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갓 창업한 회사가 직원 수에 비해 조금 큰 사무실을 빌렸는데 웹사이트를 만들 기술자를 아직 채용하지 못했다면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에게 사무실 책상 한 켠을 빌려주고 사무실을 쓰는 동안 웹사이트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사무실 임대인은 단기 프로젝트에 정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고, 임차인은 다양한 일을 원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경제다. 쓰이지 않고 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새로운 경제 구조의 핵심 자원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아직 쓰이지 않는 자원을 찾아낼만큼 눈이 밝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한다. 이런 움직임이 보편화되고 충분한 규모로 확대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부담없는 값으로 훨씬 많은 자원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의 소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구적인 자원 낭비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