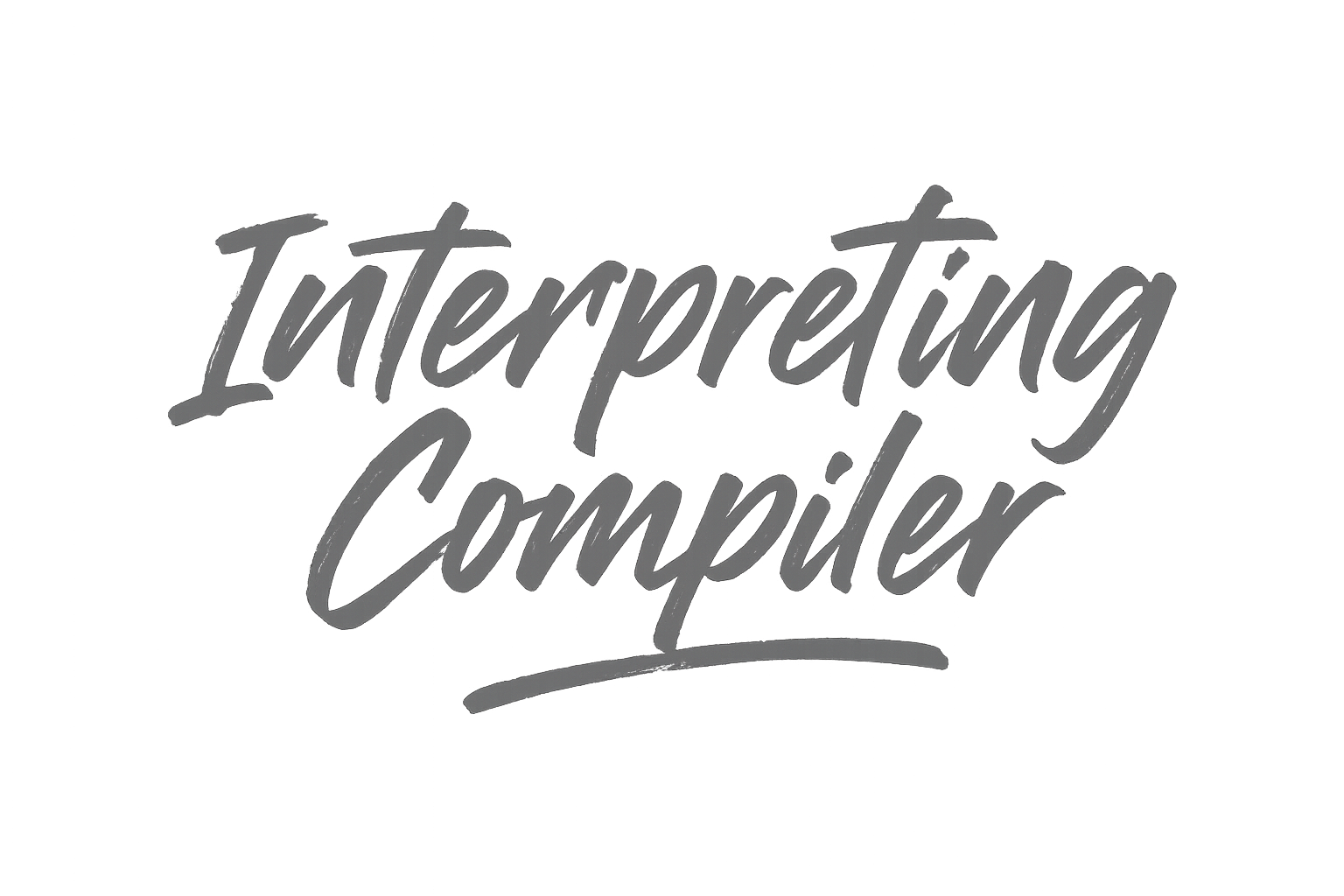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갑(甲)'을 넘어서고 싶었던 기업인...
by 김상훈
2011년 초 쯤으로 기억합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을 처음 본 건. 그 전에도 각종 행사 자리에서 몇 번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대개 그렇듯 간단히 인사를 하고 말거나, 특별한 용건이 없다면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여하튼, 황 사장과 역삼동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잡은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출입처가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선배들은 그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일종의 머릿수 맞추기 밀 술상무 역할이죠. 작은 체구인데 참 당당하더군요. 꺼내는 이야기도 거침없었고, 삼성과의 트러블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풀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이 양반이 삼성에 맺힌 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채기엔 어렵지 않았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지요. 예컨대 기자는 참 깐깐하고,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고, 말하기 싫은 내용을 계속 캐내려고 하고.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인상들(직접 겪지 않았다고 해도)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기자에 대해 조금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갖곤 합니다. 저는 회장, 단체장, 협회장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과도한 ‘갑(甲)’ 같은 느낌이랄까요.
당시에는 황 사장에게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대기업 사장과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미세한 차이점까지 파악하는데 능통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비슷하게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두 시간가량 있으면서 술잔도 참 많이 돌았으니 조금은 흐트러지고 부드러울 법도 한데, 너무 꼿꼿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때 느낀 인상은 꽤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2011년까지 잘 나가던 주성엔지니어링이 그 이듬해부터 비틀거렸고, 황 사장은 대외 활동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협회 회장이 참석해야 할 대외 행사에는 황 사장보다는 남민우 사장이 나올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올해 2월에는 벤처협회 회장 직에서도 물러났고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난해에는 과거 벤처협회 회장을 맡았던 이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도 있었죠. 사실 황 사장과 연관관계가 없는데도 이런 일들과 연결지어 이미지가 굳어진 건 아닌 지 생각해봅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의 인사. 중소기업청장에 황철주 사장이 내정됐다는 소식. 그 다음은 언론 보도로 잘 아실 테니. 저는 처음 소식을 듣고 ‘이 인사 참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과정에서 보인 허술함은 두고두고 지적 받아 마땅하겠지만. 또, 황 사장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도 인사를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닌 이상, 사람들이 갖는 인상이라는 게 다 매우 주관적이기 쉽거든요.
월요일에 황 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 일은 자연스럽게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직업 특성 상 매일 터지는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까먹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 조선 B1면에 나온 황 사장 인터뷰. 잠결에 보고는 ‘아, 물먹었다’ 싶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단 안심합니다. 리뷰를 올립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지라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황 사장이 삼성과 싸운 일들, 현대차와 거래하기 위해 겪은 에피소드. 그리고 그가 중기청장이 되면 하고 싶었던 정책. 중소기업들이 지금도 매일 겪는 현실이라며 자주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 따라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대기업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지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지요. 확실한 팩트가 없어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얘기가 돌면 인상은 굳어져버립니다. 마치 관료들은 뭔가 시키려고만 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더라... 라는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2년 전 저녁 자리에서 느낀 인상의 원인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꼿꼿함이라는 게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갖는 ‘갑’의 풍모가 아닌 치열하게 ‘갑’들과 싸우면서 체득한 것이라는 거죠. 황 사장 말대로 "피눈물이 났던" 기억이 쌓이고 쌓이면서. "애니콜 신화도 수많은 중소 벤처인들의 땀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의 말. 이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은 적어도 황 사장이 중기청장이 되면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었나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모로 참 아쉽습니다. '대기업은 적'이라고 단정 짓고 비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만, 왜 중기인들은 계속 어렵다고 할까. 대기업을 대하기 힘들어할까.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by 박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