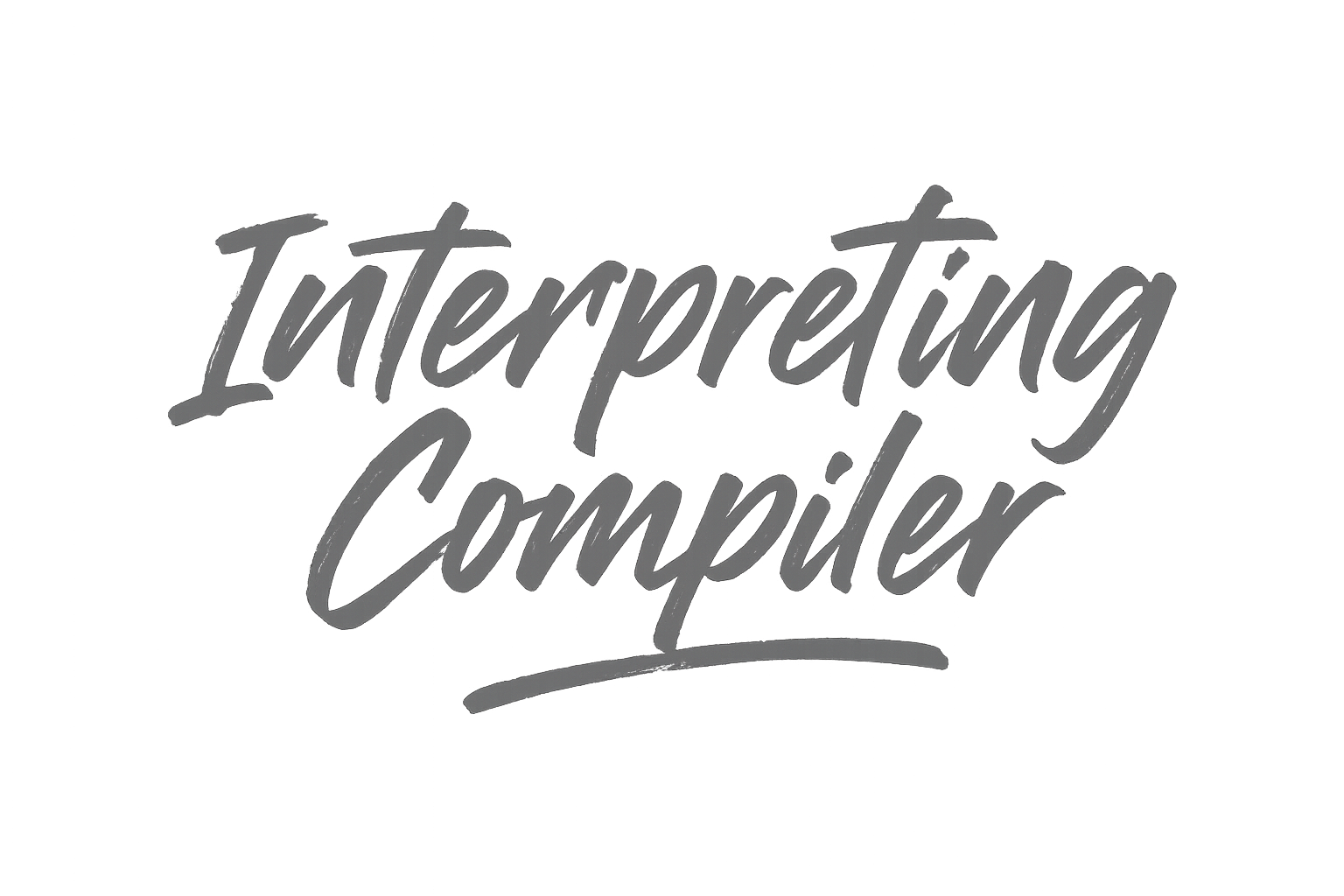글 쓰던 선배
by 김상훈

힘이 든다.
이 블로그에 IT 관련 얘기가 아닌 걸 쓰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인데, 신해철 얘기를 썼던 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IT는 오간데 없고 먼저 떠난 사람 얘기를 쓴다. 구본준 선배와의 인연은 신기하게도 처음과 마지막 대화가 다 기억난다.
“선배, 저 선배 팬이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처음이었다. 2005년 대구였다. 장소도 잊혀지질 않는다. 구본준 선배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했던 경제부 산업담당 기자를 하던 때였다. 한국전자전 취재 장소였다. 사실 구 선배의 바이라인은 엄청나게 봤지만, 본인을 현실에서 만난 건 처음이었다.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취재하러 온 현장에서 후배 기자가, 그것도 다른 회사 기자가,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듣는데 “팬이었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나중에 동아일보의 다른 선배가 전해 줬다. “너 구본준 선배 아니? 네 얘길 하던데.” 전략같은 건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그렇게 선배에게 내 이름을 알렸다.
“상훈씨, 내가 요새 그냥 노는데, 시간이 좀 많아. 같이 밥이나 먹자.”
그건 이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받은 전화였다. 마지막 통화였다. 페이스북으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들으니, 그냥 밥이나 먹는 일은 좀 뒤로 미뤄도 되는 줄 알았다. 그 때 빨리 약속 잡고 만나서 밥을 먹을 걸, 하는 흔한 후회를 나도 하게 될 거라곤 그때만 해도 몰랐다. 얼마전 선배의 페이스북에 밥 안 사주시냐는 댓글을 남길 때까지도 여전히 몰랐다.
난 동아일보에 있었고, 구 선배는 한겨레에 있었는데도, 묘하게 선배한테 많은 걸 배웠다. 열혈강호와 용비불패를 다룬 기사, 베르세르크를 소개한 기사, 미스터초밥왕 기사 등등 한달에 한두번은 꼬박꼬박 만화를 보면서 밤을 새곤 하던 1990년대 후반의 대학생에게 구 선배의 기사는 단비 같았다.
만화 담당 기자가 이러저런 신문사에 생기던 때였지만, 그 때 내게 '정말 만화를 좋아하는 기자'라고 느껴진 건 구선배 뿐이었다. 늦게 군대를 전역한 뒤 일자리를 찾을 때가 되었을 때, 언론사 시험을 봤던 것도 “만화 기사를 써도 기자를 할 수 있구나” 싶어서였다. 사건 취재하고, 정치인을 취재하는 건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기자라는 직업을 존경하긴 했지만, 내가 그걸 하기엔 내 능력이 부족해 보였으니까. 그런데 뭔가 만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도 기자를 할 수 있고, 그게 나같은 독자들에게 정말 절실히 읽힐 거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런 모델이 구 선배의 형태로 한국에 있었으니까.
많은 선배들이 내게 뭔가를 가르쳐줬다.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고, 취재원은 저렇게 관리하는 거라고 했다. 그런데 지내보니 다 틀렸더라. '이렇게'대로 쓰는 정형화된 글은 독자들이 진저리를 냈고, '저렇게'대로 뻔한 수에 따라 관리당하는 취재원들은 기자를 더러운 벌레 보듯 보더라. 그냥 내가 좋아서 쓰는 글을 독자들도 좋아했고, 내가 좋아서 만나는 취재원들은 인생의 스승이 됐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 그리고 구 선배는 몰랐겠지만, 그렇게 좋아서 하는 법을 구 선배에게 배웠다. 사실 구 선배는 늘 "난 정말 글을 못 쓴다"면서 글 잘 쓰는 사람을 부러워했다. 말도 안 되게 글을 잘 쓰면서 그 소리를 하도 하니까 주위에서 정색을 하면서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허영"이라고 뭐라고 했을 정도로. 그리고 취재원들하고는 같이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함께 집을 짓고 옆집 이웃으로 살기도 했다. 그래서 구 선배 주위에는 글쟁이가 득시글거렸고, 전문가들이 도와줄 준비를 다 해놓고 우글대곤 했다.
그런 선배가 어느 날 저녁 자리에 날 불렀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올 텐데, 다 책 읽고 쓰는 걸 좋아하고, 좋은 분들이라며. 만나보니 정말 그런 분들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앉는 게 뭔가 자리의 격을 떨어뜨린다 싶어 보일 정도로.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구 선배가 "상훈씨 책은 정말 열심히 아주 수고롭게 취재해서 쓴 책이던데? 책 들여다보고 자료 모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발로 뛰어서 쓴 거로구나 싶어서 대단했다"고 말해줬다. 서로 칭찬하는 의례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냥 최근 읽은 책들 얘기를 서로 죽 늘어놓던 와중에 지나가듯 툭. 구 선배는 그 자리에서 내 책을 내가 선물해 드리기도 전에 스스로 사서 정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냥, 구 선배는, 늘,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진짜 좋아한다는 걸 아무런 숨김 없이 그냥 말하곤 했다. 그래서 선배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리고 나같이 별 볼일 없던 사람도 그 좋은 사람들 틈에 쉽게 섞여 들어가게 도와줬다.
“난 상훈씨가 어디서 뭘 하든 그냥 계속 후배라고 생각해. 우린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구 선배와 얼굴을 맞댔을 때 나눴던 얘기였다. 사실, 그래서 힘든데도 꼭 이 글을 써야지 싶었다. 우린 어디서 뭘 하든 글 쓰는 사람이니까. 선배한테는 꼭 이렇게 작별해야 할 것 같아서. 눈물도 안 난다. 그냥 거짓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