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그 모든 이야기 #2
by 김상훈
지금은 야후의 CEO가 된 마리사 메이어는 초기에 구글에 입사할 때 '구글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 세가지'를 대라는 질문에 둘 밖에 대답하지 못한 걸 10년 넘게 아쉬워했다. 그게 그녀의 성격이었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야심 만만한 천재소녀. 물론 지금은 애 엄마다. 어쨌든, 과연 그녀는 잘 해나갈까. 이번 인터뷰에서 레비에게 메이어에 대해 물었다. 야후 CEO가 된지 몇달 지났는데 과연 잘 해나가리라고 보느냐고. 레비의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이미 과거에도 와이어드에 메이어를 'The Ultimate Googler'라고 칭찬하며 잘 해나가리라는 예상을 썼던 바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에겐 과제가 분명해졌다는 게 레비가 본 차이점이다. 지금 메이어가 하는 일은 "야후가 잘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란 얘기다. 메이어가 야후에 퍼뜨리고 있는 구글 문화는 공짜 식사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다.(물론 공짜 식사와 최신 스마트폰을 주기는 했다.) 그보다는 메이어가 퍼지기 원하는 문화는 "기술 중심적이고 좀 더 구글처럼 운영되는 회사"다. 그리고 구글처럼 운영되는 회사란 구글처럼 성공적인 제품을 가진 회사를 뜻한다.
과연 첫 제품이 무엇이 될까. 레비는 "전혀 새로운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리커처럼 과거에 굉장히 성공했던 제품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 "무엇이 됐든 첫 승부수가 될 제품이 메이어에 대한 평가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레비가 보기에 야후 직원들은 최근 수년 간 처음으로 일에 집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까. 마침 레비와 인터뷰를 했던 그날 오후, 야후코리아는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 아주 초기에 야후가 구글 검색을 돈주고 '써주던' 시절, 구글이 야후 덕분에 망하지 않고 사업을 벌이던 그 시절, 야후 경영진은 구글이 검색을 개선하면 곧바로 검색량이 급증하는 걸 지켜보면서 "두달 만에 트래픽이 50% 늘어났다"고 '불평'했다. 구글을 통째로 인수할 수도 있던 회사가 구글에 검색 사용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고 투덜댄 것이다. 이런 걸 보면 마리사 메이어가 야후의 CEO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구글을 만든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천재적인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천재적인 코더(coder)는 아닌 모양이었다. 래리와 세르게이가 엄청난 규모의 서버 인프라를 감당하기 위해 모셔온 전문가 어스 홀즐은 세르게이와 래리가 파이선으로 짜 놓았던 초창기의 구글 코드를 보면서 '대학 코드'(University Code)라고 비웃었다. 두 사람이 짜놓은 코드는 개념을 잡는데에는 훌륭했지만, 구글이 성장하면서 받게 되는 대규모 부하를 처리하기에는 '걸리적거리는 수준'의 형편없는 코드라 결국 모두 다시 작업해야 했다.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홀즐 또한 훌륭한 엔지니어였지만 구글이 꽁꽁 감춰뒀다. 그가 공식석상에 나오는 일은 매우매우 드물었는데, 올해 IO에서 구글은 홀즐에게 데이터센터 프레젠테이션을 맡겼다. 그리고 구글의 컴퓨팅 파워도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다. 최근에는 기자들에게 데이터센터 내부도 보여줬다. 레비는 "내가 구글 정책 변화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이라면 무조건 꽁꽁 싸매던 구글이 이젠 그것마저 공개하기 시작했음을 자신의 기사만 봐도 알 수있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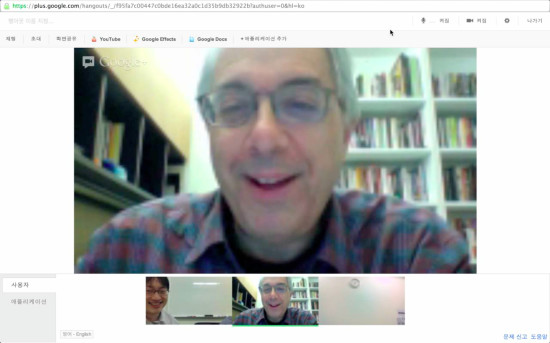
몇달 전 SAP의 HANA(하나)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간단히 배웠는데, 최근 이쪽 업계의 대세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고 한다. 특히 SAP처럼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강점을 가진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도 인메모리로 처리한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DB를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느려터진 자기 디스크를 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 시스템의 병목이 돼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니까 매스데이터 시대에 하드디스크란 과거의 백업용 자기 테이프를 주 저장장치로 쓰던 시절 만큼 낙후된 일이다.
하지만 2003년부터 구글이 레비가 '인램(In-RAM)'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몰랐다. SAP이 하나를 상용화한 것도 작년 일이다. 그전에는 경제성이 부족해 상용화가 힘들었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인더플렉스에 보면 구글은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진작에 인덱스 DB를 인메모리 시스템으로 관리했다. 구글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회사다.
구글의 차세대 제품 기획 중에 레비가 책 끝머리에서 밝힌 기획안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블루베리 팬케익'이라는 프로젝트다. 책을 읽다보면 구글의 특징은 연구개발이 곧 제품화를 뜻한다는 것인데, 다른 기업들은 R&D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상용화하려면 수많은 복잡한 중간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구글은 엔지니어들이 모두 R&D를 하고, 이렇게 만든 제품을 최대한 상용화한다. 중간단계를 남에게 맡기는 일 따위는 없다. 그래서 블루베리 팬케익 프로젝트도 한국어판 인더플렉스가 나오기 전에 상용화됐다. 책에서 얘기하는 블루베리 팬케익 프로젝트의 정의는 이렇다. "검색하지 않아도 알아서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 시스템". 눈치빠른 구글 팬들은 바로 무릎을 칠 일. '구글 나우' 얘기다.
2004년 4월 1일, G메일이 처음 나왔다. 레비는 그 때 우연히 빌 게이츠와 다른 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게이츠는 레비와의 인터뷰에서 G메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도대체 왜 메일에 1기가나 필요한가요?"라고 끊임없이 물었다. 메일을 제 때 지우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두는 건 낭비고, 저장공간은 아껴 써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다.
게이츠의 시대는 컴퓨팅 리소스를 아껴서 써야 했던 시기였다. 게이츠는 그 시기에 개인용 컴퓨터에 최적화된 '날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글 창업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회사 문을 열었을 때부터 거대한 숫자(구글의 유래가 된 googol이 바로 1 뒤에 0이 100개 붙는 수다.)만 생각했다. 낭비 따위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래리와 세르게이가 단골로 했던 얘기가 있다. "무어의 법칙 몰라요? 내년이면 반값이 될 겁니다." 이들에게 무어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당연한 일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