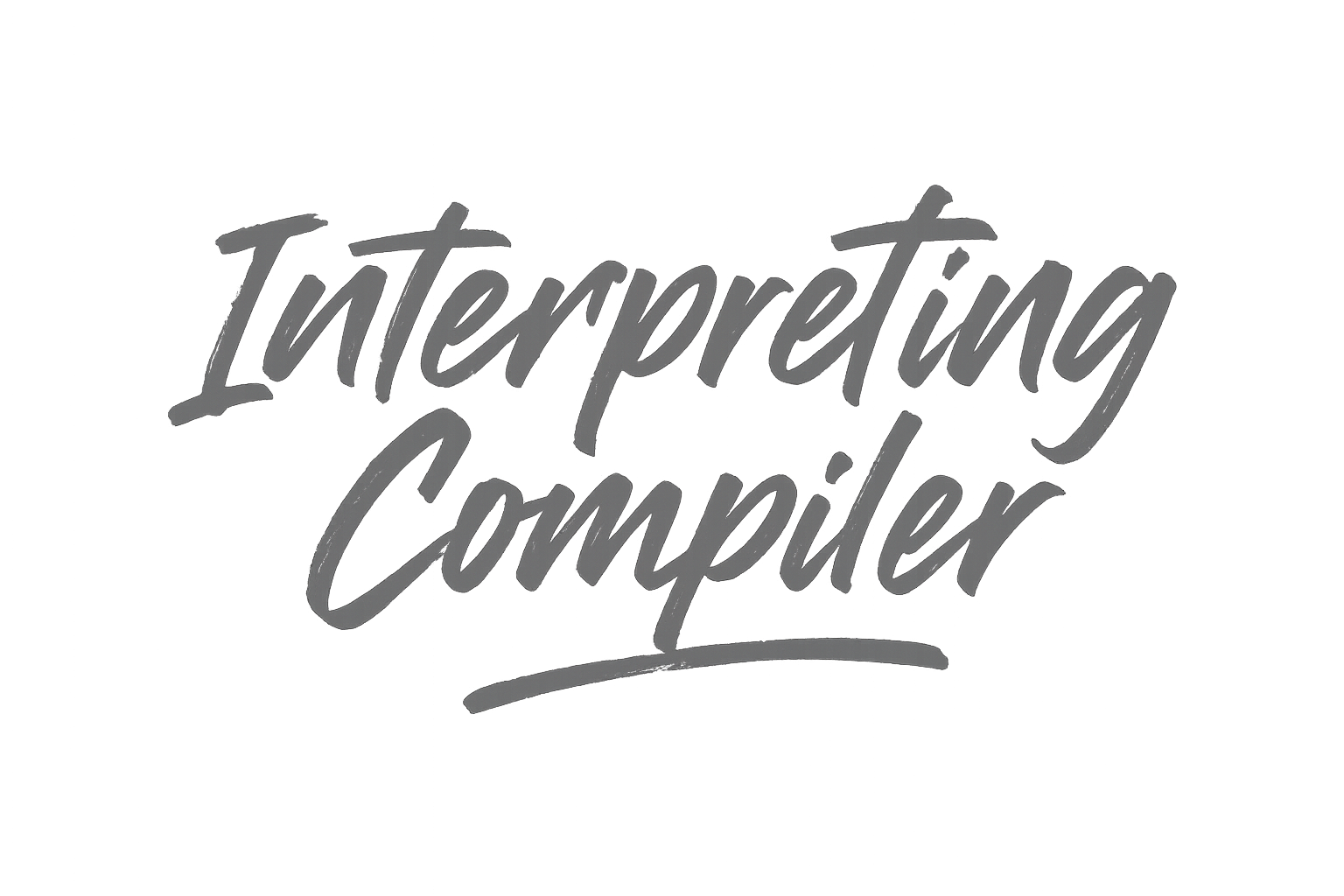한국의 에어비앤비
by 김상훈
2009년 뉴욕에 있을 때였다. 맨해튼의 물가는 정말 살인적이라서 뭐 하나 싼 게 없었다. 물 한 병에 2달러는 기본이고, 길거리에서 사먹는 거리 음식도 최소 5달러, 식당에 들어가 팁까지 주고 나오려면 혼자 식사를 해도 20달러 이하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했다. 호텔값은 더욱 비싸서 하룻밤에 200달러 이하의 호텔이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고, 200달러 초반의 호텔이란 건 대개 벼룩이 들끓을 것 같은 낡은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삐그덕거리는 침대와 냄새와 소음이 괴로울 정도인 에어컨을 감수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워낙 모든 게 비쌌지만, 그래도 이 어이없는 하룻밤 방값만 해결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때 만난 게 한국인 민박이었다. 한국인 민박은 무엇보다 값이 쌌다. 유럽 여행을 하던 시절에는 가끔 한국말이 하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들리곤 했는데 맨해튼에선 일단 가격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한국인 민박이 경쟁력이 있었다. 아주 싼 곳은 40달러 짜리 공동 기숙사 형태의 방도 있던 것 같고, 작은 맨해튼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주는 곳도 있었다. 100~150달러 정도면 꽤 괜찮은 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민박을 이용하는 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인 민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나만 믿고 일단 입금해 보라"는 식의 사업모델이었다.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루하루 빠듯한 벌이를 하는 민박집 주인 입장에서야 예약이 펑크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예약을 받을 땐 방값 전체를 받고자 하기 마련이었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처음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입장에선 알지도 못하는 민박집 주인에게 방값 전체를 선입금하는 게 쉽지 않은 노릇이었다. 그때 한인텔을 만났다. 이 업체는 이런 불편을 해결했다. 민박집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고, 수수료는 조금 떼어갔지만 예약을 받아주면서 에스크로 기능도 제공했다.
이 회사를 만든 오현석 대표는 원래 '미국 유학'이란 걸 해볼 생각이었다고 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 해본다는 MBA도 미국에서 따보고, 멋진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가 어학연수부터 시작했다. 문제는 그의 첫 미국 상륙이었다. 오현석도 다른 맨해튼 초심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일단 하룻밤에 200달러가 훌쩍 넘는, 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호텔방에 기부터 죽었다. 결국 그도 맨해튼 한인민박을 대안으로 알아봤다. 그리고 나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다. "돈부터 입금하시오" 정책 말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학원의 방학 기간을 틈타 '민박집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그게 한인텔이었다.
맨해튼은 지하철과 튼튼한 다리만 있으면 걸어다닐만한 곳이었다. 그래서 2009년, 오현석은 걷기 시작했다. 민박집 문을 두드리고는 '한인텔'에 민박집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무조건 걷기만 한 건 아니었다. '헤이코리안'이라는 유학생 포털사이트의 덕도 봤다. 뉴욕 인근 지역 유학생치고 헤이코리안을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PC통신 시절 만들어져 인터넷 초창기였던 90년대 말에 '크사니'(KSANY)라는 이름으로 성장해 온 서비스였다. 마침 오현석이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곳에 웹을 아는 엔지니어가 필요했고 오현석은 운 좋게도 그 때 뉴욕에 있었다. 헤이코리안에서 각종 웹 관련 기술 업무를 도우면서 그는 이곳에 가장 흔하게 올라오는 게시물 가운데 하나인 각종 부동산 정보에 관심을 가졌다. 이때 불편하기 그지 없는 헤이코리안 게시판을 통한 방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업이 될 거란 생각도 하게 됐고, 헤이코리안 일을 하면서 뉴욕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도 쌓게 됐다.
한인텔은 그렇게 민박 중개 사이트로 성장했다. 뉴욕에선 꽤 이름도 얻었다. 인터넷 덕분에 알음알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한인텔은 여행사 가운데서도 의미있는 규모의 업체가 됐다. 하나투어, 자유투어 같은 메이저 여행사만큼은 아니지만 여행업계가 집계하는 내국인송출(한국 관광객의 해외 여행)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한인텔은 국내 10위권 업체가 됐다.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이때부터다. 미국에선 뉴욕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걸 세계로 확대하면 어떨까 싶었던 것이다. 유럽에도 한인민박이 잘 되는데 이런 민박업체들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떨까. 비슷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슷한 업체가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인텔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큰 성공을 거뒀다. 에어비앤비였다. 남는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게 해주는 실시간 민박 중개업체. 오현석도 이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바로 한인텔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델이었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 중 한 곳이 비앤비히어로였다. 비앤비히어로의 목표는 명확했다. 에어비앤비도 좋지만 한국을 찾는 관광객 가운데 상당수는 아시아 관광객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만들어진 회사였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찾는 아시아 관광객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에어비앤비의 사용자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8월 2일 한인텔과 비앤비히어로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온 두 회사가 1:1로 합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었다. 한인텔은 젊은 엔지니어가 창업한 회사였고, 사업을 시작한 공간은 뉴욕 맨해튼이었지만 주된 고객은 한국인이었다. 반면 비앤비히어로는 40대 마케터가 창업한 회사였고, 사업을 시작한 공간은 서울 이태원이었지만 주된 고객은 외국인이었다. 두 회사 아직 작은 회사다. 합병까지 가야 할 길도 아직 많이 남았다. 하지만 두 회사 사람들 모두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로 단련됐고, 작은 성공의 경험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과연 '한국의 에어비앤비'가 될 수 있을까. 확실한 건 거기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