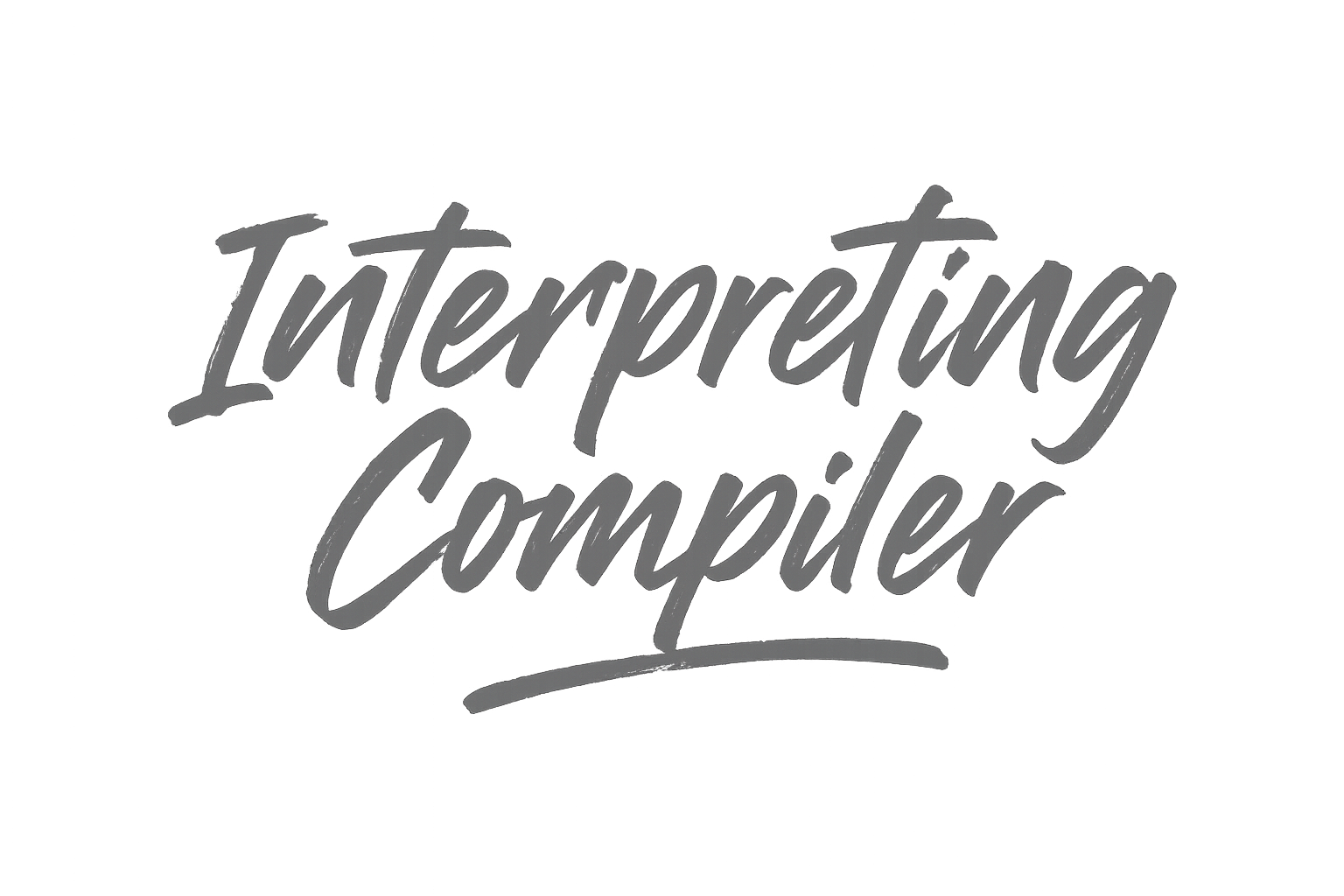인사이드 페이스북
by 김상훈
"세상에는 늘 배고픈 사람(hungry people)이 있게 마련이고, 회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해커톤은 그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육체적 배고픔 얘기가 아니라, 갈망을 뜻하는 얘기였다. 페이스북은 왜 해커톤을 하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되돌아왔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기업 문화를 해커 문화라고 불렀고, "일단 해보는 게 완벽한 것보다 낫다"(Done is better than perfect)는 페이스북의 모토는 커다란 'Hack' 사인과 함께 멘로파크 본사 건물 곳곳을 뒤덮었다. 저커버그와 셰릴 샌드버그(COO)가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로 모아진다. 3000명을 넘어선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도 30명 시절의 DNA를 계속 유지하기. 숫자가 3만 명이 되더라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해커톤은 그런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사다. 개발자들은 해커톤이 열리는 순간 해보고 싶었던 도전 과제, 즉석에서 떠오른 아이디어 등을 열심히 구체화시키고 시제품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페이스북의 새로운 기능이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만? 해커톤의 이미야 해킹+마라톤이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인사, 마케팅, 재무. 회사 내 모든 부서도 해커톤을 함께 한다. 사내 복지정책이라거나 새로운 홍보 방법 고민 등 개발자가 아닌 지원부서 직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기간을 활용한다. 참여는 물론 자발적이지만 사람들은 늘 참여한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회사니까.
"상자 밖으로 나가야 다른 세상이 보인다."
페이스북에는 널리 알려진 해커톤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가 있다. 해커먼스(hackamonth)라고 불리는 인사이동 제도다. 부서를 옮기지만, 부서를 완전히 옮기는 게 아니다. 자기의 부서와 주 업무는 그냥 두고 1년에 1개월 정도 자기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뗀 채 다른 팀으로 떠나서 일을 하는 것이다.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상자 속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일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해커먼스 제도다.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싶지만 페이스북의 생각은 다르다. 마케팅이나 영업 등 전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늘 교류해야 하는 부서야 다른 기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외에 페이스북의 핵심 부서들은 연간 계획서라는 걸 아예 작성하지 않는다. "연간계획을 세우면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이내에 마무리하는 게 페이스북의 목표다. 이번 달에 시작한 일이 다음달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해커먼스가 가능한 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팀 구조 덕분이다. 한 달 정도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팀을 떠난 뒤 다른 팀의 프로젝트에 합류해도 한 가지 일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개발팀들은 직위에 별 구애를 받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요할 뿐, 팀 단위를 넘어선 통솔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의 전략적 방향은 최고경영진이 세우고, 이 방향이 구성원 전체와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 마크 저커버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원하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래리 페이지나 최고경영진들이 구글의 마운틴뷰 본사 식당에서 진행한다는 타운홀 미팅과 비슷한 자리다. 이렇게 큰 방향이 공유되고 나면 그 다음은 팀 마음이다. 조직에 따라 대략의 카테고리 정도가 주어질 뿐 그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는 완전히 팀의 소관이다. 정신없고 통제되지 않는 문화처럼 보여도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 담당 임원만 철학이 뚜렷하다면 일하는 실무자들은 자유롭게 개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서비스에서 사라질까봐 해커톤과 해커먼스까지 도입한 회사다. 어떻게든 관리계획 같은 걸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늘 바쁘다. 신나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대부분의 팀이 한 달 내로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을 한다. 당연히 늘 동시에 많은 일이 진행되게 마련이고, 아이디어는 가능한한 실제 제품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압박도 심하다. 대신 살인적일 수밖에 없는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노트북을 접어서 가방에 넣고 집에 가면 그만이다. 아이와 놀아주다가 재우고 난 뒤 컴퓨터를 켜면 그곳이 곧 사무실이다. 멘로파크 본사는 여전히 3000명 남짓한 직원이 쓰기에는 광활하리만치 넓기 때문에 개인 모두에게 넓은 책상이 하나씩 주어져 있지만,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직원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카페테리아와 볕 잘 드는 산책로, 소파와 쿠션이 놓여 있는 곳곳의 자투리 공간이 선호되는 업무 장소다. 그리고 한 달이면 대충 결론이 나는 프로젝트 덕분에 기사로도 소개했지만 이들은 자녀를 낳으면 4개월씩 유급 휴가를 떠난다. 사내 커플이면 부모가 각각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직접 아이를 돌볼 수도 있다. '내 일은 너무 중요하고 바쁜 일'이라 휴가를 못 쓴다는 건 이런 시스템에선 상상하기 힘들다.
이들과 함께 일하는 저커버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으로 나타난 건 그래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그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해서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지만, 사실 저커버그에게 거기서 그러고 있는 시간 만큼 아까운 시간도 없을 게 틀림없다. 페이스북의 IPO는 늘 비교되는 선배 기업 구글의 IPO와 비슷한데, 페이스북은 구글의 창업자들이 '창업정신과 기업문화를 지키겠다'며 도입했던 듀얼클래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 주식 1주마다 1표의 의결권을 주는 대신, 신규로 발행하지 않는 저커버그의 기존 주식에는 주 당 2표의 의결권을 줘서 강제로 의결권 과반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대주주의 전횡이 우려스러우면 투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공모가는 '버블 논란'이 생길 정도로 높아진다.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따르는 겸손한 자세 대신 '이게 우리 스타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은 투자자를 질색하게 만드는 듀얼클래스 제도는 물론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월스트리트에 선언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러저런 요청 사항을 공개 대상 기업에게 밝히는데, 페이스북은 "싫으면 말고" 식으로 "페이스북에 투자하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이다. 투자 로드쇼도 비디오로 만든 뒤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비디오를 30분 씩 틀어댔다. 월스트리트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만해 보이지만, 이들은 해커다.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뱅커도 아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틀로 페이스북을 바라본다. 페이스북의 매출도 결국은 광고와 온라인 콘텐츠 판매수수료 정도에 그칠 것이고, 그런 서비스 치고는 지금 예상 시가총액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검색창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광고가 제한적이고, 구글이 모바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 또한 이런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지적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구글이 아니라는 간단한 사실은 반영돼 있지 않다. 구글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페이스북의 역할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9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 가입자 가운데 5억 명 이상이 하루에 한 번 씩 페이스북에 접속한다. 이들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광고를 보는 소비자이기도 하겠지만, 핀터레스트에 접속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계정 인증(oAuth)을 이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블로그에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남기기 위해 접속하기도 하는 간접 사용자다. 구글 사용자는 대부분의 경우 구글을 사용하기 위해 구글에 접속하지만, 페이스북 사용자는 다르다. 이들은 그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접속한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인터넷=독점'이라며 질색했지만, 내가 보기엔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이다. 인터넷의 본질은 연결이다. 심지어 구글 마저도 그 연결(하이퍼링크)을 이용해 검색 알고리듬을 만들었다. 또 하나,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제공해주는 제품(검색결과)의 품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페이스북 사용자는 페이스북 덕분에 알게된 제품(친구들이 추천하는)의 품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터넷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구글이어도, 야후여도 관계없다. 페이스북은 그저 옆에서 그런 주인공을 거들 뿐이고 그 위치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
페이스북이 거품일지 모른다는 각종 비판에 페이스북을 대신해 대변에 나섰던 패스트컴퍼니의 기사에선 지금의 상황을 "우린 겨우 1이닝에 접어들었을 뿐"이라고 표현했다. 동감이다. 페이스북은 구글이 아닌데 사람들은 구글의 잣대로 페이스북을 본다. 물론 페이스북이 망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지구를 엮어낸 거대한 소셜네트워크에게는 위기보다 기회가 훨씬 많은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