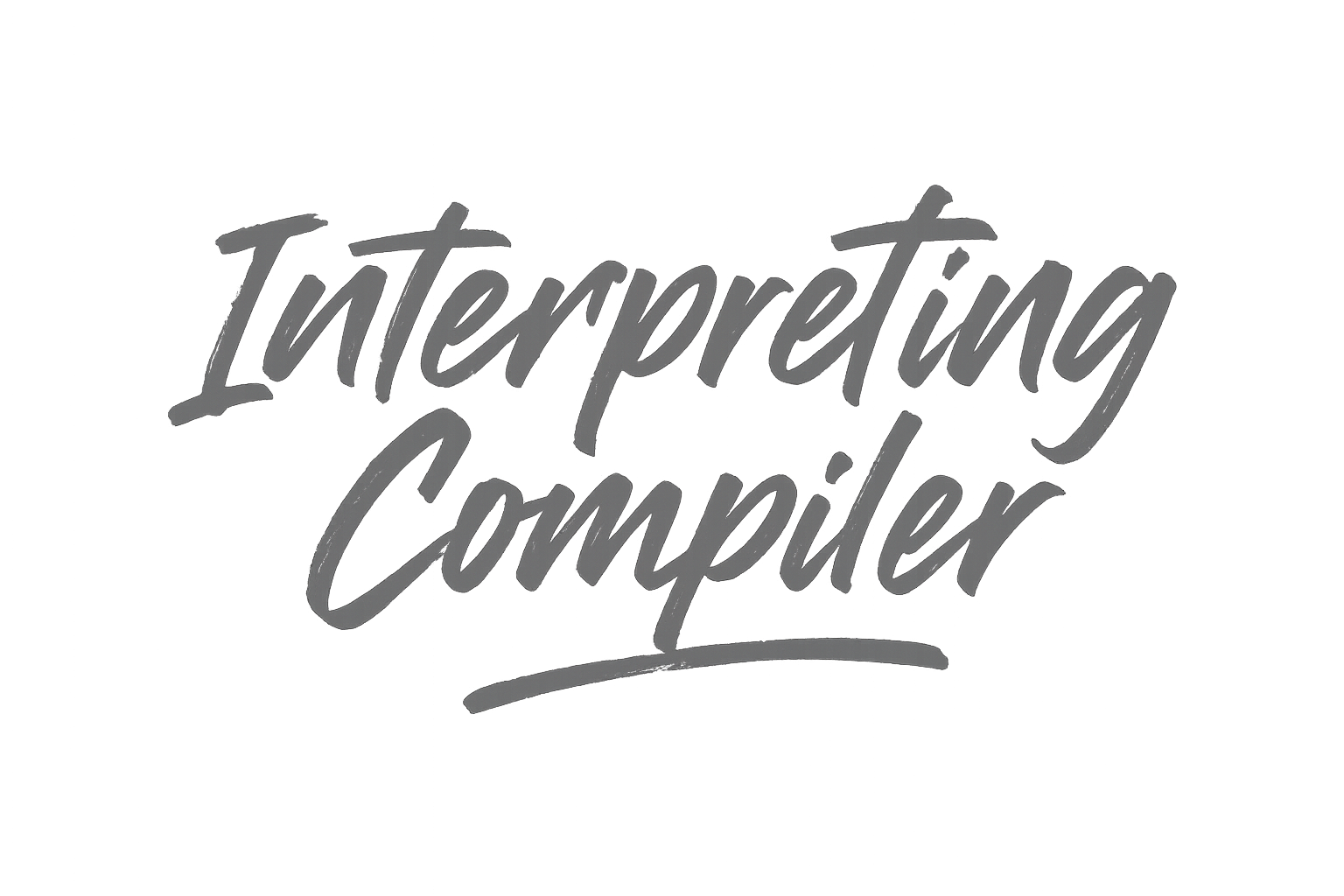재미 없는 음악 이야기
by 김상훈
하고 싶은 얘긴 하나다. 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것.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돈을 내는 건 이 음악을 듣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의 나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준 아티스트에게 제일 감사하고, 그들의 번잡스러운 일을 말끔한 기술로 처리해서 편하게 음악을 듣게 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음악 유통업체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음악 팬으로서 더 좋은 음악을 앞으로도 듣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해부터 디지털 음원을 파는 회사들이 일제히 음원 가격을 올리자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손봤고, 이에 따라 가격을 올릴 방법이 마련된 게 직접적인 계기인데, 값이 올랐는데도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 등은 여전히 불만이다. 음반사도 화를 낸다. 통신사와 포털 등 국내 주요 디지털 음악 유통업체도 툴툴댄다. 왜 그럴까?
개정된 규정을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설명해보자. 현재 음악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두 가지 방식으로 팔린다. 최종 소비자 가격은 유통업체에서 정한다. 물론 가이드라인도 있고, 업계의 관행도 있다. 하지만 단순화해서 보자.
현재 노래 한 곡 당 정가는 600원이다. 이 가운데 권리자에게 360원이 돌아가고, 유통업체가 240원을 갖는다. 스트리밍 음악은 한 곡 스트리밍 될 때마다 권리자에게 7.2원이 돌아간다. 유통업체는 회원 1명 당 월 6000원을 받는다. 이게 개정안의 골자다.
실제는 전혀 다르다. 곡 당 600원을 내고 음악 한 곡을 사는 소비자는 전체음악 서비스 이용자의 1%도 안 된다. 대개 월 50곡까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한다. 600원에서 60%를 떼는 구조는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미국 음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튠즈 뮤직스토어(곡 당 평균 약 1100원)와 비교하면 값이 너무 싸다. 그래도 이게 비싸 보이게 만드는 상품이 있으니 당연히 싼 상품을 이용하는 셈이다. 스트리밍은 계산이 복잡하다. 권리자는 회원 1명 당 얼마 식으로 돈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1명 당 1800~2400원을 받은 뒤 재생된 노래를 헤아려 복잡한 권리자 집단이 이를 나눠갖는다. 게다가 배분받는 수익도 개별 가수나 음반사, 작곡가 등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다. 이들은 다양한 협회에 의해 대표되는데 협회가 수익을 일괄 징수하고 이를 협회 내부의 개별 개인들에게 나눠준다.
이러니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유통을 맡는 통신사나 포털의 경우 주력상품이 스트리밍이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음악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할 때 이를 재깍 받아들여 안정적으로 전송해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버 인프라와 음악이라는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수다. 통신사와 포털이 음악 유통의 최상위 포식자인 이유도 이들이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인터넷 스트리밍 인프라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스트리밍이 대세인 한 이들은 경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버를 사용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네이버와 비교해서 인프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인터넷 벤처란 존재하기 힘들다. 제작원가가 차이나는 것이다. 통신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멜론이 국내 1위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MP3 음악을 듣는다. 그 스마트폰 요금을 좌지우지하는 게 통신사다. SK텔레콤이 "멜론으로 스트리밍하는 음악은 LTE데이터 사용량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만드는 순간, 종량제 데이터 요금이 음악 요금에 포함되는 기타 업체들은 게임 끝이다. 가격 경쟁력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건 통신사와 포털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신들의 기득권 장벽이다. 이 장벽 덕분에 독과점이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권리자에게 회원 당 매출을 나눠주는 구조는 유통사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다. MP3를 한 곡 당 600원에 판매한다고 치자. 유통사는 이번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는 곡 당 240원을 번다.(얼마전까지는 한 곡 당 350원을 챙겼다.) 그런데 회원 당 재생수로 계산하는 스트리밍 판매에선 월 6000원 요금 가입 회원이 10만 명이라고 쳤을 때 월 6억 원의 매출이 생긴다. 최대한 권리자에게 유리하도록 비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최대 수익배분율인 매출의 60%를 10만 명에게 받는다고 쳐보자.(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다.) 유통사가 가져가는 돈은 2억4000만 원이다. 이 돈을 벌려면 곡 당 240원을 챙길 수 있는 600원 짜리 노래 100만 곡을 팔아야 한다. 회원 수 10만 명을 모으면 이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왜 곡 당 600원 짜리 노래를 팔려고 노력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유통사가 노래를 곡 단위로 팔 마음이 들 이유가 없다. 아이튠즈가 놀랍고 독특한 건 수익모델 설계가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 쉽고, 음악 판매에 따른 돈이 실제로 창작자나 음반사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애플은 1100원이 넘는 노래를 팔아서 700원 가량을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한국에선 600원 짜리 노래를 팔아서 360원을 돌려주는 게 싫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그나마 재생될 때마다 돈을 돌려주는 게 싫어서 회원 당 묶음 판매를 권장하고, 그나마 그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MP3 50곡+무제한 스트리밍' 식의 한 번 꼬아놓은 상품으로 요금을 바꾼다. 통신사 사람들의 머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좋은 머리를 지금 어디다 쓰고 있나?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위에서 스트리밍의 경우 최대 수익배분율인 매출의 60%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될 리가 없다. 주력 상품이 스트리밍 100%인 상품보다 'MP3 다운로드 50곡+스트리밍' 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50곡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고 매월 이걸 꽉 채워서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용기간이 5년이고, 사용가능장소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현금처럼 쓰이는 상품권인 백화점 상품권조차 약 5%는 쓰이지 않고 사라진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한 달이고, 사용처도 특정 사이트의 음악다운로드 뿐인 50곡 다운로드 계약의 사용률이 형편없으리란 건 어렵잖게 추측 가능하다.
유통사가 수익배분률을 잘 밝히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만 한 번 해보자. 유통사 입장에선 이렇게 소비자에게 '50곡'을 팔아놓고는 권리자에게 돈을 지불할 땐 실제 다운로드된 곡 수 만큼만 곡 당 요금을 주면 된다. 심지어 이는 '대량 할인구매'로 계산돼 곡 당 60%의 매출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곡 당 최저 6.7% 이상의 수익배분만 하면 된다.(올해부터 곡 당 최저 단가가 9원으로 개정됐다.) 월별 평균 다운로드를 60%로 잡아 30곡이 다운로드된다고 가정하면(개인적으로는 실제 다운로드 수가 30곡도 안 될 것이라 추측하지만) 50곡을 판매한다고 해놓았어도 실제로 통신사가 회원 1인 당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익배분요금은 27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스트리밍 배분율은 곡 당 150원(대량할인가)×50곡=7500원을 1만1000원에서 제외한 3500원으로 잡힐 테고, 이 스트리밍 매출의 60%는 2100원에 불과하다. 결국 통신사는 1만1000원 짜리 상품을 고안해 4800원을 권리자에게 떼어주고 6200원을 챙기는 셈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수익배분은 물론 추측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런 수익배분 내역 관련 취재에는 어떤 공식 답변도 하지 않아왔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 일단 음악 가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 값을 올리자는 소리지만, 무조건 올리자는 건 아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판매를 회원 1인 당, 또는 매출액 당 일정 비율로 하는 지금의 음악판매 방식 대신 스트리밍 횟수에 따른 이른바 '종량제'도 도입돼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창작자들이 배를 곯는 건 음악 팬으로서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큰 돈을 벌어서 포르셰도 타고, 비싼 밥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그 생활이 좋아서 제정신 못차리면 망할 테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벌어서 음반사도 세우고, 좋은 프로듀서도 될 테고, 후배도 키울 테니까. 이수만이나 양현석, 박진영이 지금은 기업가지만 예전에는 좋은 가수이고 춤꾼이었던 게 사실 오늘날 케이팝의 성공 배경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은 돈 좀 벌어도 된다. 우리가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떼돈을 번다고 욕하지 않는 것처럼, 음악가의 성공은 건강한 음악 산업 생태계의 시작이다.
오히려 문제는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통신사나 포털에서 사라지는 현재의 구조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불투명한 스트리밍 음악 판매와 벌크형 판매 방식이다.
또 현재 음악 한 곡 당 판매가격도 솔직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한 곡 당 가격을 쉽게 6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사서 소유하는 음악은 판매 자체가 극히 드물게 이뤄진다. 내가 그렇게 음악을 산다고 하니까 음악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정말 희귀한 소비자"라고 신기하게 봤을 정도다. 그러니 600원이 아이튠즈의 절반 가격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미국에서 한 곡의 가격은 실제로 1달러 전후지만, 한국에서 음악 한 곡의 실제 가격은 대량할인곡 한 곡의 가격이다. 이는 유통사 기준(최저단가 90원을 60%로 봤을 때)으로 봤을 때에도 150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것도 하한가격이 정해진 올해 1월부터 얘기고, 얼마전까지만해도 150곡에 9000원, 그러니까 1곡 당 60원 같은 요금제가 넘쳐났다. 한국의 음악 한 곡 가격은 미국의 절반이 아니다. 10분의 1, 2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자. 판에 박힌 똑같은 음악이라고 툭하면 씹히는 아이돌 가수들도 그들의 팬클럽은 가수의 CD를 산다. 사진도 넣고, 사인도 넣고, 보너스트랙도 만들어서 2만 원, 3만 원에 팔아도 이 충성스러운 팬들은 그 CD를 매진시킨다. 그런데 그런 아이돌 가수들 또는 이른바 '빠순이'들을 보며 혀를 차는 자칭 수준 높은 소비자들은 1곡 당 60원 짜리 음악 값을 좀 올리자고 하면 비싸다고 툴툴댄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조금 더 안 담아준다고 화내도 되는 뻥튀기 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