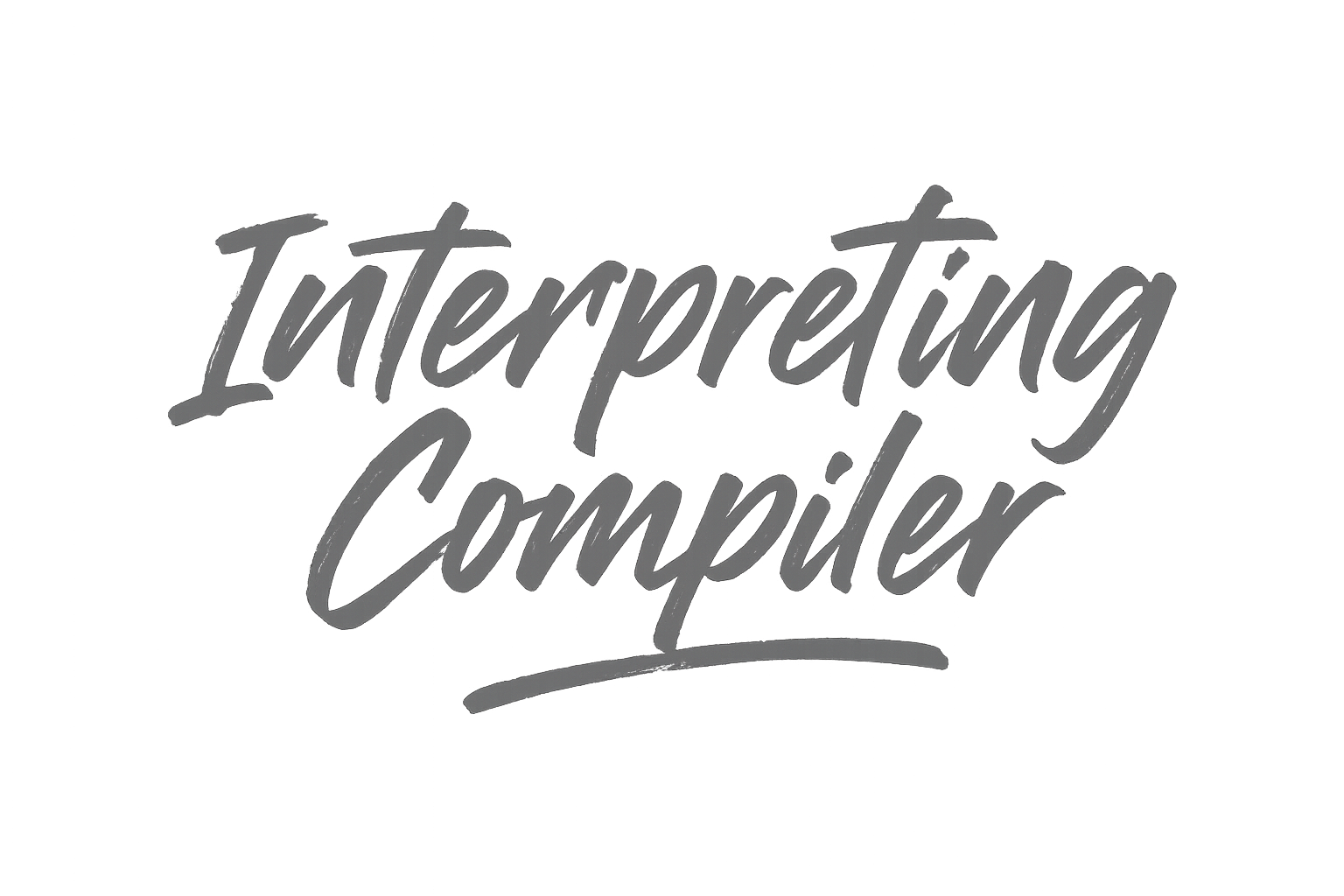저는 기계가 아니라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by 김상훈
설 연휴 마지막날이 당직이라 오늘부터 하루 일찍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아내도 출근했고, 집에 있어봐야 늘어질 게 뻔한지라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이 카페엔 콘센트가 하나뿐인데, 조금 전 학생 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다 둘이 뭔가를 큰소리로 상의합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아 노트북 써야하는데 어쩌지, 나가야 하나. 나 꼭 노트북 써야 하는데...", "다른 데 갈까? 세시간 반 동안 앉아있을 곳이 여기 말고 없는데...", "글쎄, 어쩌지. 전기 있어야 하는데."
제 바로 옆에 서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저희도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혹시 다른 자리를 쓰시면 안될까요?"라고 물어봤다면 전 이미 이 자리에서 한시간 정도 충전을 한지라 흔쾌히 그러라 했을 겁니다. 왜 저를 보고 말을 걸지 않은채 들으라는 듯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그들은 제 얼굴을 한 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한걸음 옆에서 둘이서만 대화를 하다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미처 대화에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만원 지하철을 탈 때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얘길 하시죠. 물론 그분들도 그 많은 사람을 이뤄가는 한 명입니다. 이럴 때면 전 마치 NPC가 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NPC란 온라인게임 속에 등장하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사람이 조작하는 플레이어 캐릭터와는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행동이 정해져 있는 Non-Player Character입니다. 인격이 없는 프로그램이죠. NPC가 된 저는 이런 분들 앞에서 그저 사물이 되어갑니다. 앞에 있는 플레이어의 반응에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거나 몸을 움츠리든지, 그냥 조용히 듣지 못한 척 하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죠...
최근 평소 즐겨 읽는 @gatorlog님의 블로그에서 '아이폰과 침묵의 소용돌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던 공간에서 대화가 사라져 버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 대신 함께 앉아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트위터를 하는 이상한 현상을 다룬 글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경험들이 앞에 있는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인격을 갖춘 대화상대가 아닌 일개 사물처럼 대하는 현상이라면, 이 글에 나오는 현상은 인격을 갖춘 '안면이 있는' 대화상대를 눈 앞에 두고도 그들보다 오히려 사이버 커뮤니티 속의 대화 상대에게 훨씬 친밀하고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현상이죠.
우리의 인간 관계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트위터가 대단하고, 페이스북의 성공이 놀랍다면서 관계망을 기술로 확장한다고 장밋빛 미래라도 도래할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십 수백년 간 이어온 사회적 관계와 규범을 무시한 채 눈앞의 대상을 사물화해 버리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죠. 20세기의 우리는 도시화를 걱정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모조리 파괴되고 도시라는 섬에서 모두가 익명의 그늘에 숨어 살아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가 지난 세기의 화두였죠.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이뤘지만 '소외'의 문제가 그 이전 세기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피와 살을 갖춘 다른 사람들을 NPC처럼 만들어버리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조차 사이버 관계망보다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해입니다. 설 기간 동안에는 노트북을 덮고, 스마트폰의 데이터통신도 꺼놓은 채 가족과 친지들에게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저부터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