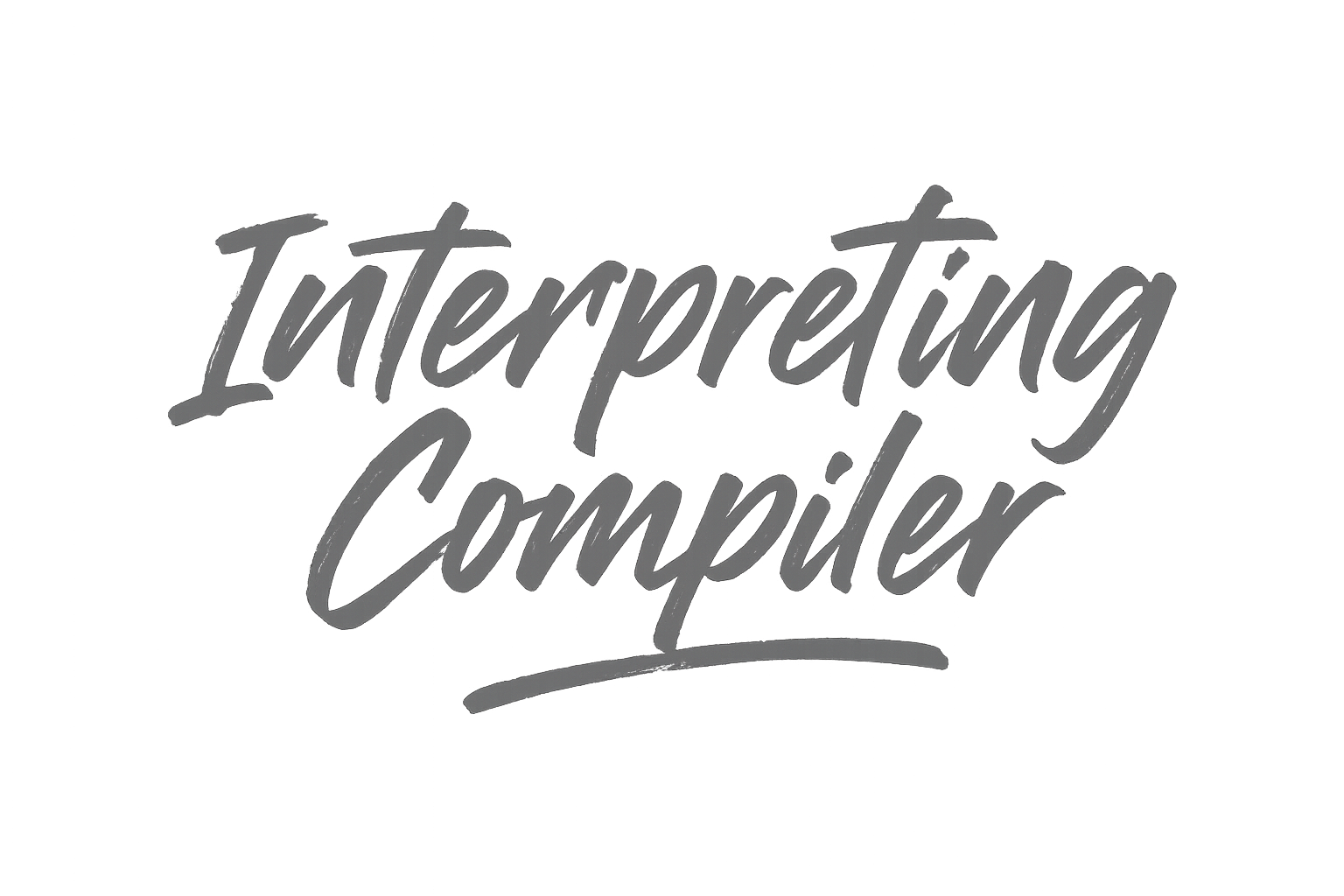제프 래스킨
by 김상훈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가운데 95%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IBM 덕분이었습니다. IBM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고서는 그 규격을 공개하자 미투(Me, too) 제품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 대부분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왕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매킨토시입니다. 컴퓨터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모두 말이죠.
매킨토시가 탄생한 것은 1984년입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 발표회장에서 매킨토시로 하여금 합성된 언어로 말을 하게 합니다. 매킨토시는 뭐라뭐라 한참 떠들다가, 마지막에 한 마디를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 아버지와 같은 분을 소개해 드리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때 뒤에서 묵묵히 분노를 참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킨토시의 '진짜 아버지'였던 제프 래스킨이었죠.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발한 '애플II'를 자신이 거의 다 개발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는 제프 래스킨이 세워 놓은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매킨토시는 '혁신'과 '최초'로 분칠된 아리따운 제품이었습니다. 스티브는 매킨토시에 환상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와 마우스라는 혁신적 기능이 포함된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쳤죠. 커서로 명령어를 입력해 작동시켜야 하는 IBM 컴퓨터에선 꿈도 못 꿀 일이라는 비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개념은, 이미 제록스의 팰로앨토 연구소에서 다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스티브가 한 일이라고는 개발자들을 데리고 제록스 연구소에 견학을 간 뒤, "저런 걸 만들라"고 자신의 개발팀을 닥달한 것 정도였죠.
게다가 이 아름다운 컴퓨터를 구상했던 것은 제프 래스킨이었습니다. 래스킨은 이미 빌 앳킨슨, 버렐 스미스 등 재능은 뛰어났으나 괴짜였던 직원들을 한 데 모아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놓았어요. 래스킨이 이 팀을 구성했을 때, 스티브는 이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그 때 '리사'라는 자기만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서 매킨토시는 쓸데없는 일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래스킨의 팀은 회사 구석의 작은 빌딩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매킨토시를 개발하고 있었죠. 그러다 리사 프로젝트가 점점 좌초하기 시작합니다. 스티브는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스티브는 매킨토시 팀에 눈을 돌립니다. 창업자이자 대주주였던 스티브가 매킨토시의 팀장을 맡겠다는데, 래스킨에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에 등장한 매킨토시는 래스킨이 초기에 꿈꿨던 매킨토시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래스킨이 원했던 새로운 퍼스널 컴퓨터란 오늘날의 PDA처럼 텍스트를 방향키로 오가며 조작할 수 있는 식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터'처럼 빵을 넣으면 구워져 나오는, 매우 사용하기 편리하고 단순한 기계가 래스킨의 목표였죠. 하지만 스티브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바꿀 멋진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쉽고 편한 것보다는 'COOL'한 것이 중요했죠. 결국 매킨토시에 멋진 케이스와 화려한 그래픽을 덧붙인 것은 스티브였습니다. 스티브는 래스킨이 만든 맛있는 케잌에 장식을 올리고 포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래스킨이 착하고 성실한 배우자를 구하는 모범생이었다면, 스티브는 결혼생활이야 편하든 말든 관계없이, 함께 있으면 가슴이 뛰고, 데이트를 하려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식당의 모든 손님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게 할 정도로 매력적인 연애 상대를 찾는 바람둥이였던 겁니다.
제프 래스킨은 2005년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몸 담았던 전문 분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작이었죠. 쓰기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모든 제품을 구상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애플을 그만둬야 했지만, 사실 평생 그를 먹여살렸던 것은 '매킨토시의 실제 개발자'라는 칭호였습니다. 유명한 BMW의 iDrive 시스템을 리뷰한다거나, 대학에서 UI 관련 강의를 했던 것 등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