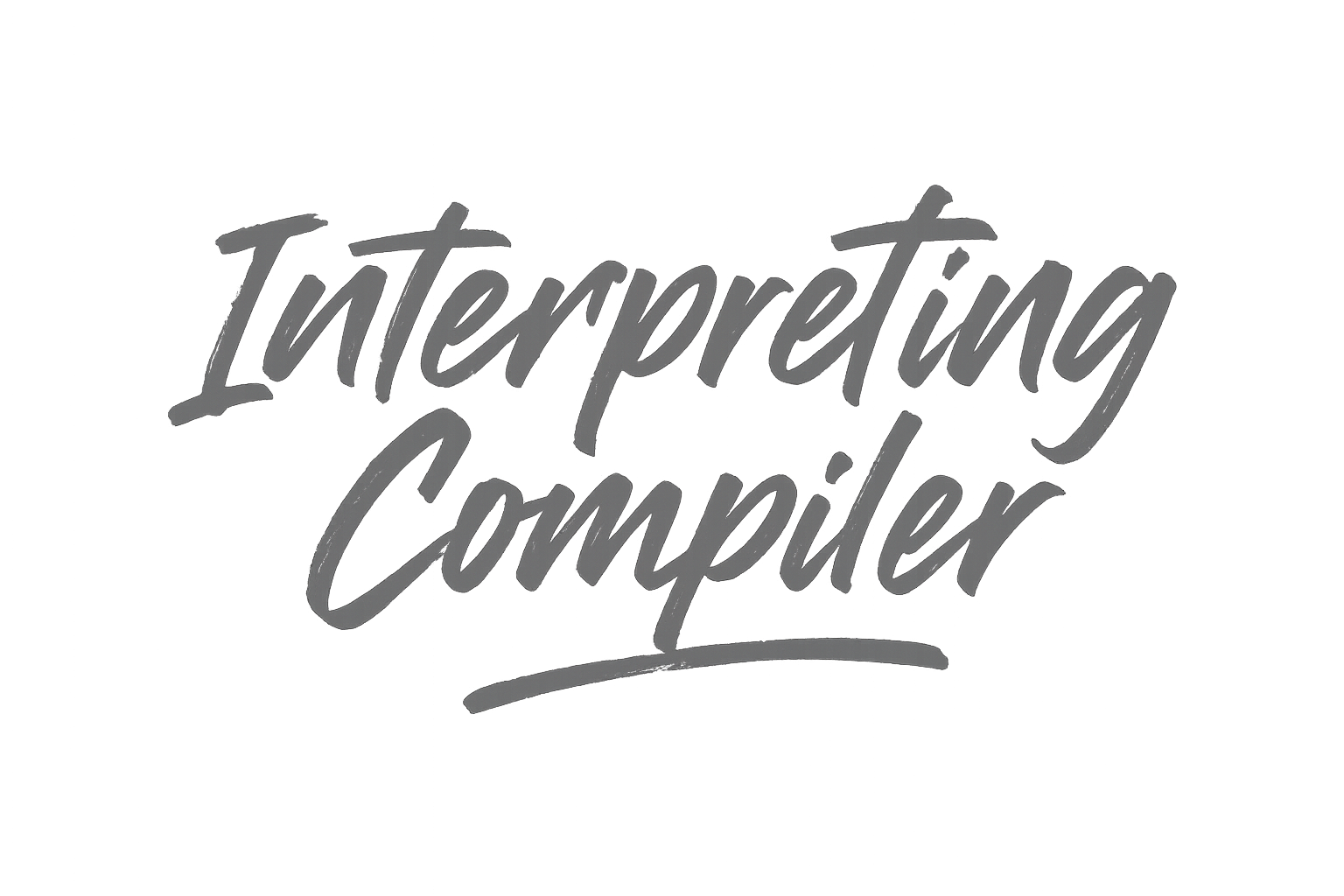오답노트
by 김상훈
아마 이 칼럼을 쓰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할 줄 애초에 알았다면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칼럼이 나간 그 날 밤,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길었지만 핵심은 한마디였다. "이통사의 '업'은 뭘로 재정의해야 할까요?" 누군가 글을 읽어주고 반응을 보여준다는 건 글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반응이다. 나라고 다를 리 없다. 진지하게 몇 차례고 이 문자를 들여다봤다. 메시지를 보낸 분은 "요즘 많이 고민하는 주제"라고 썼다. 진지하게. 얼마나 진지했으면 한밤중에 칼럼을 쓴 기자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을까. 그런데 내가 고민하려니 막막했다. 원래 남 얘기는 늘 쉬운 법이지만 그걸 내가 하려면 장난이 아닌 법이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다.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은 좋은 경영자의 필수 덕목이다. 그것이 기업을 변화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변화의 격랑 위에 올라 앞서 달려나가게 도와준다. 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도대체 이 변화의 시기에 종이 위에 잉크를 써서 매일 밤마다 백만 부 가까운 작은 책 두께의 인쇄물을 집집마다 배달하는 일에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 정보를 생산하는 일이라고도 했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라고도 했으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허브가 되는 일이라고도 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검증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되묻고 있으려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 분에게 이런 말은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이 업의 본질을 아무도 모른다. 답은 없다."
뉴욕타임즈는 시가총액, 매출, 다루는 취재영역과 기자의 수 모든 측면에서 동아일보보다 10배 이상 크다. 미국의 경제규모와 인구가 한국과 그와 비슷한 차이를 보이지 않나 싶다. 그런데 그들도 답을 모른다. 수익모델을 찾겠다면서 이것저것하다가 실패하고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나을리 없고, 가디언과 르몽드라고 다를 바 없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어제의 사업모델은 계속 퇴화하는데, 내일의 사업모델은 찾지 못한다. 오늘의 사업모델을 지속하면 망할 게 뻔해 보인다. 그런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두명일까. 누군가는 잠을 못 이루고, 누군가는 배를 갈아탈까 고민할 테고, 누군가는 잘못된 길을 정답인 줄 알고 걸어가다 후회하고 돌아올 테다. 왜 우리 회사는 페이스북이 아닐까. 왜 우리 사장은 스티브 잡스가 아닐까. 왜 이 회사는 망해가던 애플의 조너던 아이브(지금의 애플 디자인 담당 수석부사장) 같은 나를 몰라봐 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오래 생각해보니 내 칼럼은 잘난 척이었다. 나를 뻐기는 건 아니었지만, 잘난 회사의 잘난 부분만 보여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사실 대부분의 배움을 시행착오에서 얻는다. 애를 키워보니 안다. 불은 뜨겁고, 얼음은 차가우며, 빨간 음식의 대부분은 맵다는 사실은 말로 가르쳐봐야 들으면서 잊는다. 겪어보고 알게 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통찰은 경험이 제공한다. 그러니 정답보다는 틀린 답에서 배우는 게 맞다. 능력이란 건 절대로 쉽게 생기지 않는다. 어제 실수하고 헤매고 잘못했던 경험이 없다면 내일 성공하고 앞지르고 올바르게 나아갈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오답노트다. 뭘 실수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 적어놓는 오답노트. 한 번 틀렸던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틀리지 않으려는 자세가 정답을 찾아낸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을 찾아내지 못한 지금까지의 실수를 죄악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수를 없던 걸로 돌리고 화려한 성공을 인도해 줄 영웅을 찾아 헤맨다. 그러면 길은 하나다. 그들은 다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참, 신문을 유료화하려다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뉴스를 돈 받고 파는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뉴스를 무료화했던 뉴욕타임즈가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한다. 다시 뉴스를 돈 받고 파는 유료화 모델로 돌아서면서부터다. 그들은 실수를 잊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셨던 그 분도 성공의 방법을 찾는 분보다 실패의 교훈을 조직에 뿌리내리는 분이 되셨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