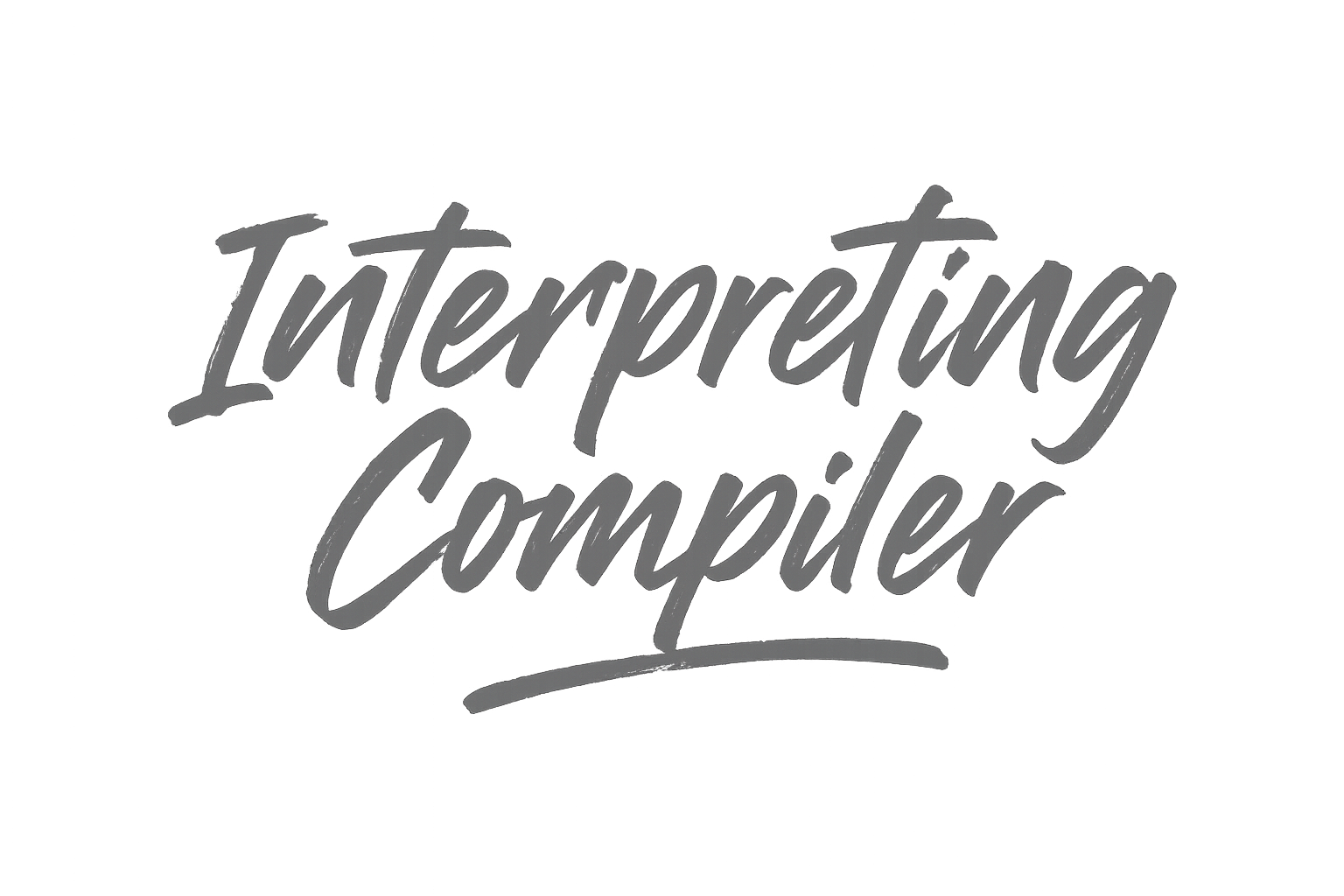프레지
by 김상훈

알바이의 얘기는 단순했다. "사람은 봐야 기억한다"(see to think)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상세대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암기 대회 챔피언들은 하나같이 머리속으로 집을 떠올리고, 가상의 방과 책상, 서랍 등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 기억해야 할 정보를 놓아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많은 내용을 기억할 때 써먹던 방법이라는데, 사실 기억력을 높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프레지의 세계는 스토리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지의 세계다.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가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건 그가 천부적인 스토리텔러, 즉 이야기꾼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을 짜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의 틀을 잡기 전부터 괴로워 한다. 무엇이 시작이며, 어디서 갈등이 고조되고 절정은 어떻게 만들며, 결말의 반전은 어떻게 처리할지 말이다. 프레지는 고민하지 말고 다 늘어놓아 보라고 얘기한다.
커다란 책상 위에 아이디어의 조각조각을 메모로 써서 올려놓은 뒤 이걸 이리저리 배치하면서 발표를 구성해 봤다면 이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아니면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할 때 포스트잇에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써서 벽에 잔뜩 붙여놓고 가닥을 잡아나갔다거나. 프레지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방식이 딱 이런 식이다. 알바이는 "화이트보드가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것이고, 슬라이드는 스토리를 위한 것"이라며 "프레지는 화이트보드"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슬라이드쇼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프레지는 스스로를 교육 도구라고 설명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 적어도 거의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 지식을 머리에 넣는 방식이다. 머리에 뭔가를 넣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지식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프레지는 잡다한 지식이 흩어져 있는 인터넷의 바다에서 의미있는 정보들 사이의 순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 순서를 만들어내는 건 프레지 사용자의 역할이고, 정보를 꿰어맞추는 과정 자체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다. 연령이 어릴수록 프레지를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선배들한테 말도 안 되게 대들면서 "나는 영상세대"라고 우겼던 것과 흡사해 보였다. 알바이에게 내가 "그래도 나는 키노트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설명했더니 알바이는 대뜸 "그건 당신이 선형(linear)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대꾸했다. 기승전결에 따라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나나 내 윗세대의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레지와 관련된 과학적 실험도 있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류의 슬라이드쇼와 프레지를 통한 슬라이드쇼를 보여줬더니 기억에 남는 정보량에서 프레지가 앞섰다는 것이다. 또 시각 기억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텍스트로만 설명되는 정보보다 훨씬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얘기다.
무엇보다 프레지를 쓸 때 생기는 장점은 계획을 짜서 만드는 키노트와 다른 새로운 발견이다. 알바이는 이를 "커다란 폭로(big reveal)"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떠오르는 걸 주섬주섬 프레지의 화이트보드 위에 펼쳐 놓으면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연결 관계가 가끔 눈에 발견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직관과 통찰을 준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 뇌 속의 뉴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고 한참을 쉬다가 유레카의 순간이 등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도대체 이런 일을 왜 시작한 것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했다. 암으로 어머니를 잃었는데, 자기는 당시에 암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상에 슈퍼마켓에 가서 치약을 사려고 해도 치약에 성분과 효능 등이 모두 나와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약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건 전혀 없었다고요. 지식은 존재하는데 그 지식을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던 거죠. 이런 게 인터넷의 시대에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의학 정보와 병원 평가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죠. 그게 프레지에요.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런 정보를 나누도록 만든 툴이죠. 그러다가 프레지가 비즈니스의 중심이 됐을 뿐입니다."
프레지는 무료다. 유료로 쓰면 한 가지 기능을 더 쓸 수 있다. '비공개'다. 지식은 공유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란 게 프레지의 철학이다. 지식을 남에게 나누겠다면 누구에게나 프레지는 무료일 거라고 알바이는 약속했다. 약속이 지켜지고 지식이 더 널리 퍼지길 바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