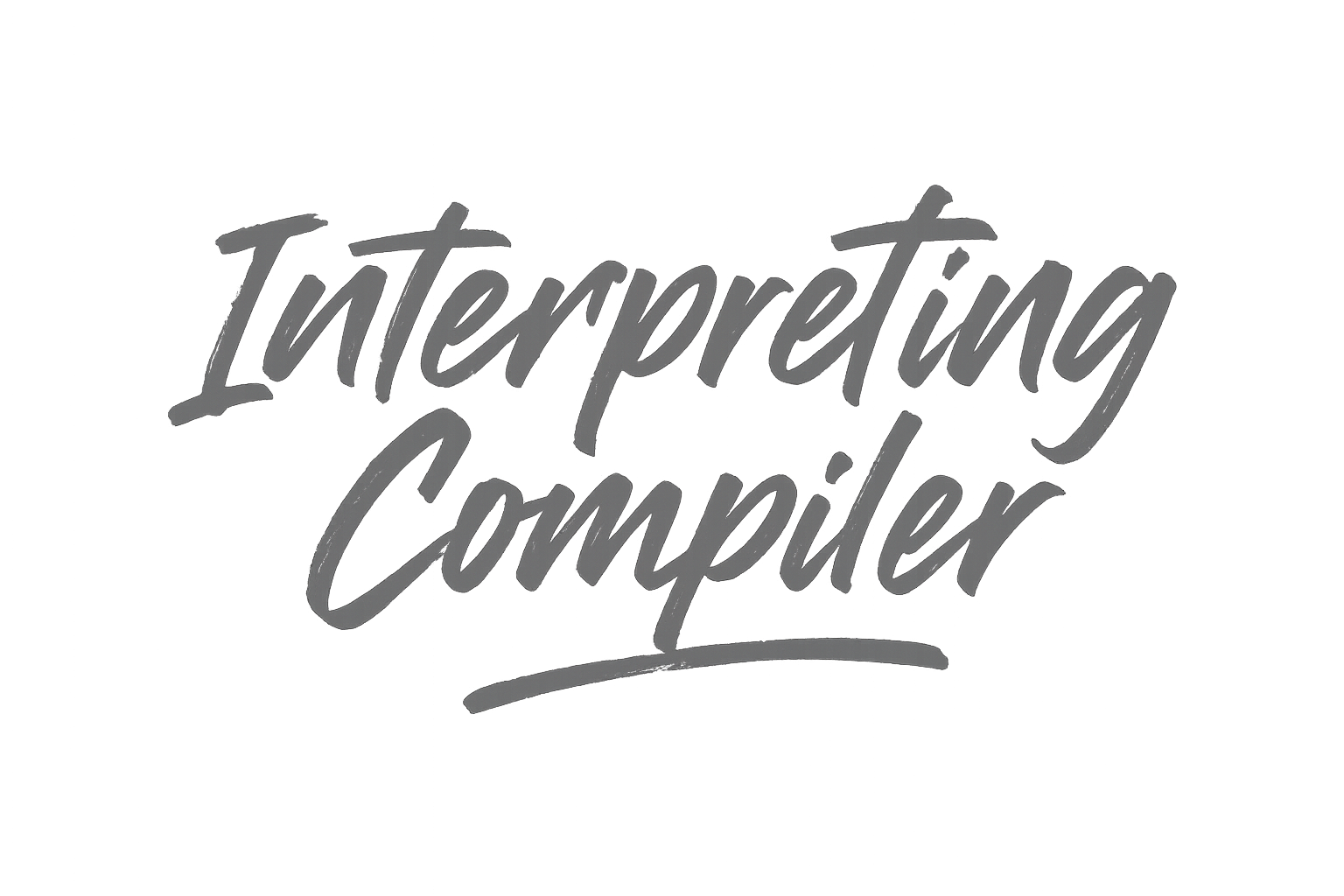숫자 3
by 김상훈
아이패드3도, 아이패드HD도 아닌 '아이패드'였다. 2010년의 아이패드와 차별화하기 위해 애플은 이 제품을 '새 아이패드'(the New iPad)라고 불렀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랐다. 새로 나온 제품에선 숫자 3이 사라졌다. 애플의 마케팅담당 수석부사장 필 실러의 공식 설명은 "예측가능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멋진 이유지만 사라진 건 예측가능성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다. 무엇보다 신제품의 권위가 사라졌다. 예전보다 개선된 제품, 성능이 향상된 제품 같은 마케팅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물론 애플은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LTE네트워크를 개선된 기능으로 내세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아이패드는 그냥 아이패드다.
어찌보면 이건 애플이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어가는 모습의 시작처럼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에 세상의 컴퓨터는 모두 그저 PC였다. '386'이라거나 '펜티엄'이라는 사랑받는 이름도 있었지만 그조차 제품을 뜻하는 모델명이 아닌 사용된 프로세서의 이름이었다. 그 시대에 HP의 PC와 소니의 PC, 델의 PC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도 없었다. 그리고 세상은 윈도의 세상이었다.
이제 세상의 태블릿은 모두 아이패드다. 킨들 파이어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조만간 그런 제품들은 '아마존이 만든 아이패드'나 '구글이 만든 아이패드'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시장을 만들기 시작할 때의 아이패드는 계속 변화를 보여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뒤에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는 사라진다. 경쟁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인 지배에는 유리하기 마련이다. 과거 애플은 디자이너와 출판계를 위한 틈새시장용 제품을 만들어 팔던 회사였지만 지금은 애플의 경쟁자들이 애플이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그리고 애플은 이제 '아이패드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로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예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 때가 생각난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를 쫓아낸 뒤에도 계속 맥을 팔기 위해서 "쿽은 맥에서만 작동한다"거나 "제대로 된 폰트는 맥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곤 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DTP 솔루션과 아름다운 트루타입 폰트를 윈도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윈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날 애플은 아이패드용 아이포토를 들고 나와 오랜 시간 설명했다. 터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맥용 아이포토보다 더 직관적이고 쓰기 편한 소프트웨어였다. 게임, 책, 교육, 요리... 이날 애플이 보여준 모든 TV 광고와 비디오, 직접적인 키노트에서의 데모는 모두 이 점 하나를 강조한다. "이제 아이패드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경쟁구도도 함께 사라졌다. 애플은 이제 안드로이드와 경쟁하지 않는다. 팀 쿡의 키노트에 잠깐 등장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은 경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조롱의 대상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그냥 키워놓은 것 같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이죠. 아이패드는 달라요."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에 펜이 달렸다고 얘기할지 모르고, 구글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멀티태스킹이 iOS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팀 쿡은 그런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아름답고, 일관돼 있으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애플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꼭 하려고 하는 혁신입니다." 경쟁제품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일관되지 않았고, 사용이 편할지 몰라도 보기좋지 못했다. 이 문제를 지적받은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제품 라인업이 복잡해질수록 통합이 더 어려워지고, 통합이 더 어려워질수록 아름답게 만들기 더 힘들어지며, 이런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고집하면 사용성이 망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느냐고? 스티브 잡스가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편집증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했던 디테일 덕분이다. "7인치 태블릿은 DOA(Death on Arrival)"라고 독설을 퍼붓고, 구글 앱의 동그라미 속 노란색 때문에 일요일에도 직원들을 회사로 호출하던 그 디테일이 클라우드와 멀티디바이스의 시대를 맞아 원칙이 됐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지만 디자인 회사를 제외하고는(심지어 디자인 회사조차) 디자이너가 독재 권력을 행사해 원칙을 모든 제품에 강제할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팀 쿡의 오늘 키노트를 듣고 있으면 잡스가 애플에게 남겨준 수많은 유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바로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 원칙이란 생각이 든다. 아름답고, 일관되고, 쓰기 편한.
그리고 어색한 화면의 시대도 함께 사라졌다. 한국에선 반쪽짜리, 어쩌면 반쪽 이하의 제품이라 별로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이날 아이패드와 함께 소개된 건 애플TV다. 별다른 기능은 없다. 그저 HD를 지원할 뿐이다. 1920X1080의 Full HD 해상도로. 그런데도 주요 제품으로 소개됐다. 발표할 게 없어서 구색을 맞춘 것이었다면 차라리 얼마전 발표했던 OSX 라이온을 이 자리에 끌고 왔으면 될 일이었다. 이들은 애플TV와 새 아이패드를 묶어서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다. Resolutionary 제품이라고. 아이폰4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건 (나중에 안테나게이트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 디자인도, 빠른 속도도 아니었다.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 달라진 디스플레이가 모두의 눈길을 끌었고 일단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면서 판매 속도도 계속 높아졌다. 다른 제품과 비교가 불가능했던 차별화된 특징이었으니까. 새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다. 별 게 아닌 듯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책 크기의 디스플레이에서 격자가 보이지 않는 해상도를 본 적이 없다. 이런 해상도면 '빛나는 책'과 다를 바 없다. 일단 눈으로 실물을 보게 되는 순간 그 디스플레이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애플은 이제 거의 모든 제품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이끌어냈다. 조금 지나면 결국 이런 높은 해상도가 산업 표준이 되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애플이 곧 표준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행히도 빌 게이츠 시절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다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