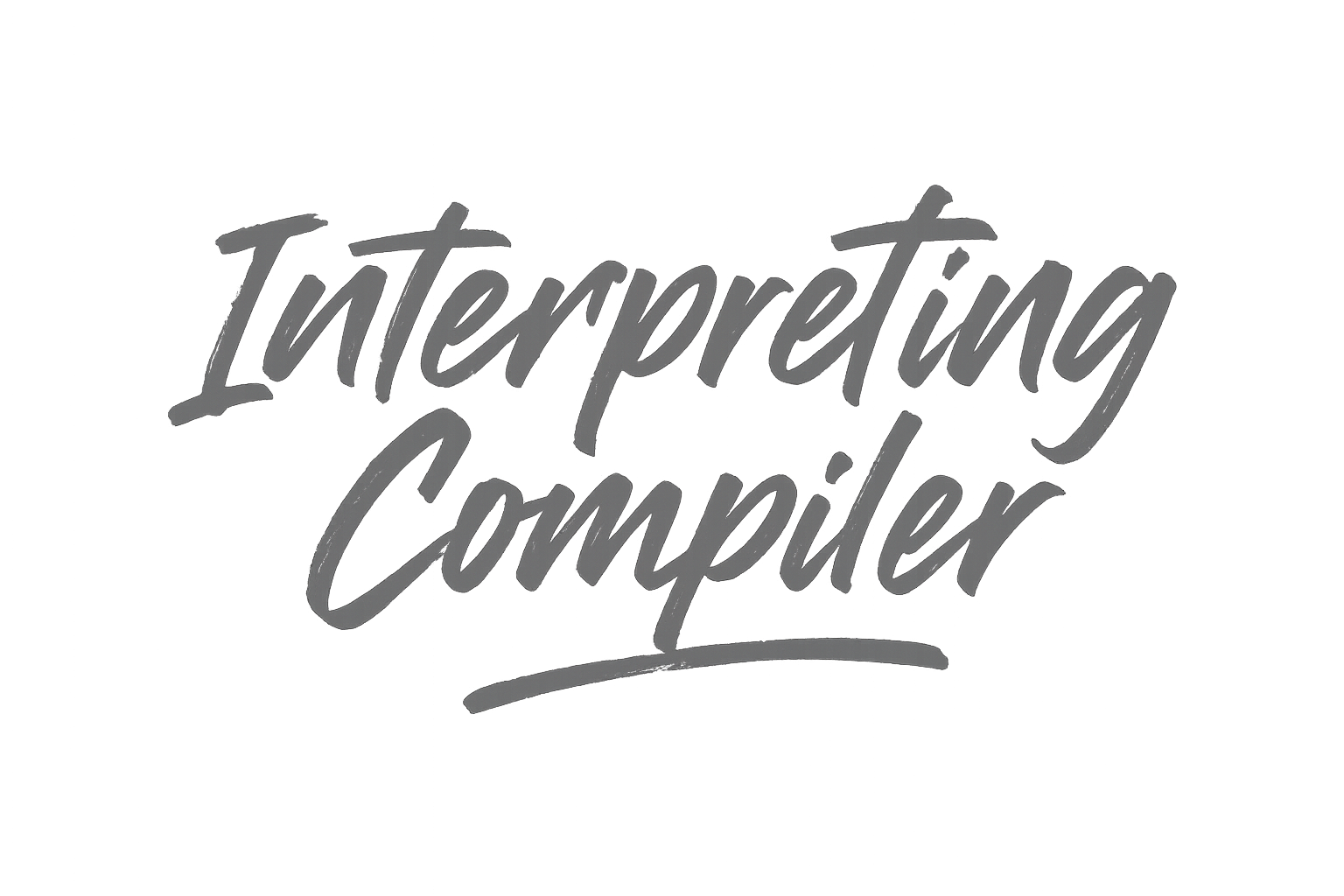쉬지 않는 사물인터넷, 근면한 기계에 대한 두려움
by 김상훈

생각해 보면 스마트키로 자동차 근처에만 가도 차와 열쇠가 통신을 나누는 시대에서 새삼스레 무슨 사물 인터넷을 강조하느냐 싶긴 하다. 그런데 가까운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게 의외로 짧은 기간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라는 걸 알 수 있다.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물인터넷의 시대에는 인터넷 연결량이 24시간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의 인터넷은 사람이 깨어 있는 시간에만 작동한다. 사람은 쉬어야 하는 동물이니까. 반면 기계는 잠들지 않는다. 초기 인터넷이 쉬어야만 하는 사람의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의 인터넷은 '쉬지 않는 인터넷'인 것이다.
이런 사물 인터넷의 특징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면 화재를 본 사람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를 알려줘야만 집 밖에 있는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수천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인터넷의 시대엔 아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갖고 외출한 집주인에게 화재경보가 간다. 집안 상황은 CCTV로 촬영된 뒤 집주인과 119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위해 대신 일해주는 기계들의 세상인 셈이다. 꼭 사람 모양의 로봇이 하녀처럼 일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가사 도우미 로봇이 우리 일을 도와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의 형태가 디지털 비트 형태로 인터넷 망에 녹아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사물인터넷이란 말을 오늘날의 의미로 처음 사용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오토ID 센터의 케빈 애시턴은 2009년 RFID 저널에 기고한 '사물인터넷이라는 것'(That 'Internet of Things' Thing)이란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문제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 정확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 세계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영 별로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다. ... 오늘날의 정보기술은 사람들이 먹고 움직이면서 쌓아놓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다. 만약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일은 컴퓨터에게 시키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 아이디어만 낼 수 있다면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별 기계 단위로 만들어지고 사라졌던 모든 데이터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인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정보는 우리가 관습에 빠져 보지 못했던 '진실'을 통계로 증명해서 우리 눈 앞에 들이민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에는 이런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잔뜩 등장했는데, 적절한 양치습관을 조언해주는 스마트 칫솔은 "그런 것까지 인터넷으로..."라는 비웃음을 받으며 등장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기계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잘못된 양치 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테다. 관습적으로 배우고 그냥 버릇처럼 반복한 잘못된 양치 습관을 기계가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양치 습관까지 측정할 정도로 곳곳에 쓰이는 사물 인터넷 기술은 센서의 소형화와 저전력화 덕분에 가능하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그러니까 숨쉬고 땀흘리는 모든 순간이 기계에 의해 측정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대다.
혁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바로 예외의 문제다. 사물 인터넷의 꽃은 데이터다. 사람이 일상 생활을 통해 만들어 내는 수많은 데이터가 사물인터넷을 발전시키는 근간이다. 사물 인터넷은 이 데이터를 살핀 뒤 평균값을 판단한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 결정을 내린다. 즉 100% 완벽한 선택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50% 이상으로 올바를 가능성이 높은 "불완전한 선택보다는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른바 '빅 데이터'를 이용해 결정을 내리는 사물 인터넷의 특징이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모든 게 '어느 정도 괜찮은' 단계로 수렴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탁월함은 '이상 신호', 즉 '아웃라이어'다. 그리고 통계의 원칙은 아웃라이어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에서도 아웃라이어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 현실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사물 인터넷의 결론은 즉 예외로 가득찬 멋진 세상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괜찮은 세상이다. 문제는 이런 적당한 효율이 혁신의 목을 조일지도 모른다는 게 아닐까. 혹은 '혁신의 기회'를 극소수의 손에만 남겨놓게 되거나.
세상은 예외로 가득차 있고, 변화는 아웃라이어들이 일으킨다. 마치 진화가 돌연변이에서 일어나듯. 그래서 모두가 칭송하는 '근면한 사물 인터넷의 시대'는 오히려 공포스럽다. 이건 인류 모두를 극단적으로 퇴보시키는 문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