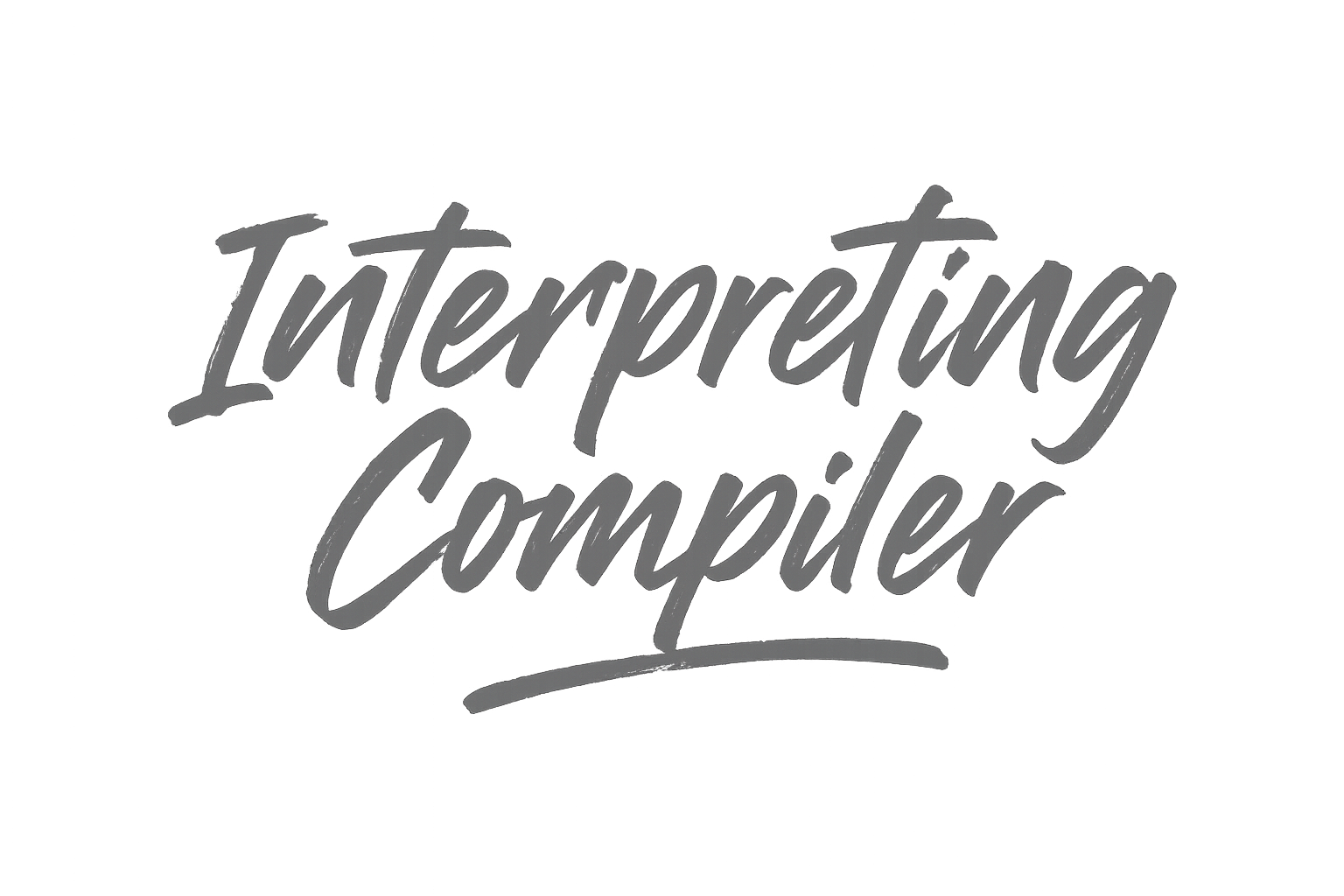영웅의 귀환
by 김상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음악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같은 이벤트에서 그 사실을 되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을 함께 즐기는 겁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사람이 공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노라 존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노라 존스의 라이브 공연이 시작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라 존스는 스티브 잡스가 소개하면서 밝혔듯, 그래미를 9번 수상했고 3500만 장의 앨범을 팔아온 미국 최고의 가수입니다. 이번 가을에 새 앨범을 낼 계획이죠. 그녀가 신곡 '영 블러드'(Young Blood)를 처음 발표한 곳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아이튠즈는 이미 세계 최대의 음악 매장이고, 스티브 잡스는 픽사의 아버지이자 디즈니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차디차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을 메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런 무미건조한 비판이 틀렸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 왔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기술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로도 썼지만, 이날 11개월만에 돌아온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건 정말로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별 게 없었던 발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아이팟에 비디오카메라 모듈 넣은 게 전부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 말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도 별로네, 라고 말하기야 참 쉬운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니어스를 계속 발전시켜서 '지니어스 믹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아이튠즈 스토어에 '아이튠즈 LP'를 집어넣는 식의 생각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맥과 아이팟을 쓰면서 느껴온 놀라운 감정은, 이 기계들은 마치 살아서 학습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업데이트가 한 번 있을 때마다 약간씩 불편했던 점들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는 겁니다.
MP3로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별점을 따로 매겨놓지 않은 곡들은 정말 찾아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라이브러리에는 수천 곡의 음악이 쌓여 있어도 듣는 곡들은 늘 비슷한 수백 곡 언저리입니다. 지겨워져서 몇 년 간 듣지 않았던 노래를 어느 날 다시 꺼내 들으면 묘한 감동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위해 정말 듣기 싫은 'the least played'를 억지로 들으며 skip을 하긴 싫으니까요. 지니어스 믹스는 그런 우리를 위해 잊고 있던, 또는 듣지 않고 처박아뒀던 노래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높은 별점을 매긴 노래들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 발견은 감사할 정도입니다. 이건 기존에 새로운 곡을 사는데 도움을 주던 지니어스 기능과는 달리, 판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온전히 사용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기능이니까요.
MP3 때문에 느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듣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뮤지션들은 앨범을 만들면서 곡의 배열 순서와 제목의 어울림까지 신경을 씁니다. 앨범 표지는 물론, 속지의 문구 하나하나까지 공을 들이죠. 기획사가 찍어내는 다 똑같아 보이는 그만그만한 이상한 사람들이야 대충 노래 한두곡 만들어 팔아대기에 디지털만한 공간이 최고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래가 낱개로 흩어져 나가는 걸 보는 뮤지션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겠죠. 저도 섬세한 앨범 아트워크나 뮤지션들이 보너스처럼 넣어두는 이러저런 생각의 편린들을 보는 재미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걸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튠즈 LP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애플의 배려입니다. 뮤지션들은 아이튠즈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앨범에 직접 접근해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에선 에픽하이의 타블로같은 친구들이 신나서 자기 앨범을 바꿔놓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건강한 것 같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별로 나아진 게 없어보여 걱정입니다. 잘 지내요, 스티브 잡스.
p.s. 위 사진은 애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파일의 제목이 재미있네요. hero20090909.jpg랍니다. CEO, boss, steve 등등 흔하게 유추 가능한 제목들 대신 hero가 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상사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떤 파일명을 붙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