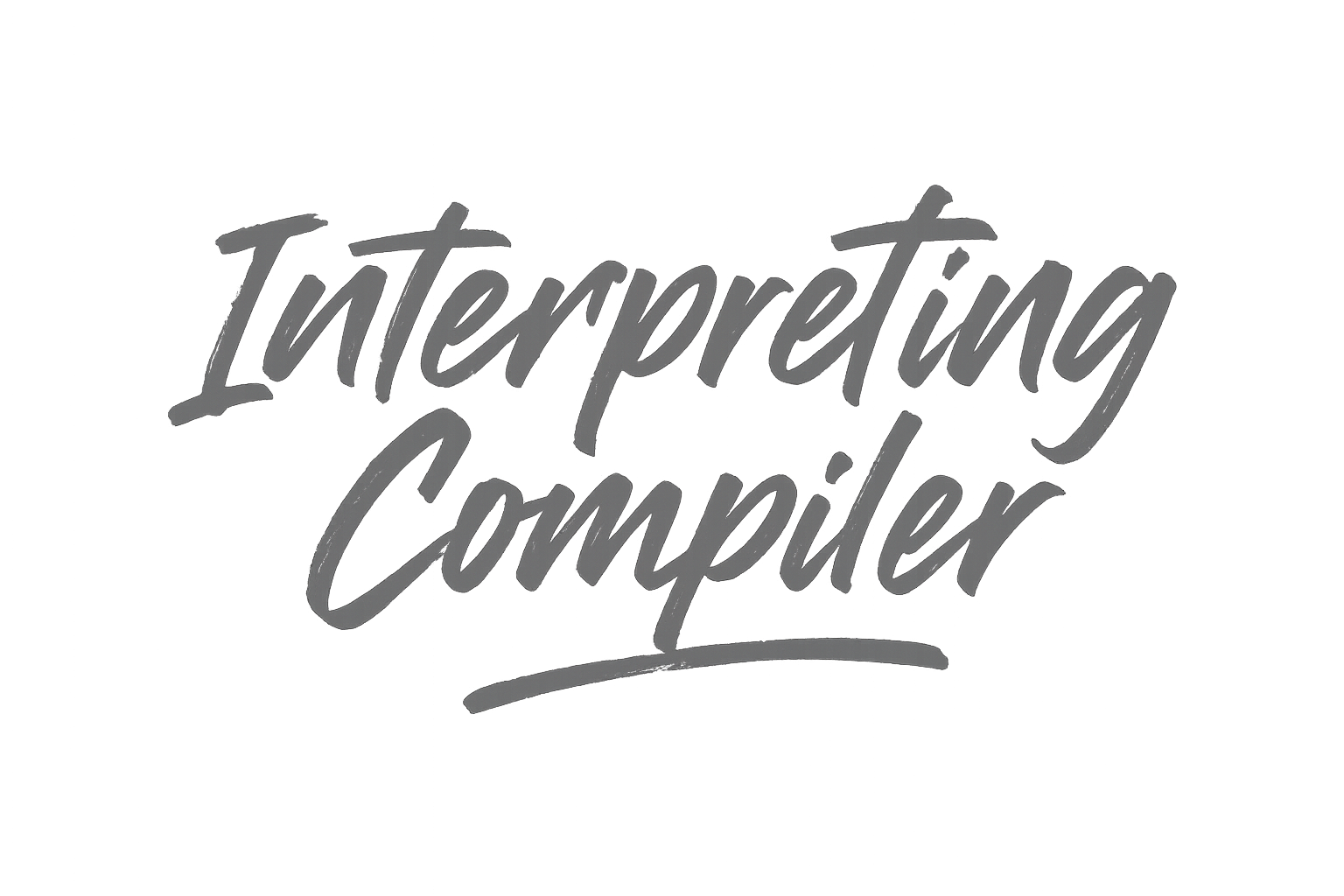의사 이야기
by 김상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전에 썼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벌써 나온지 5년도 넘었으니 일부 전재합니다. 제 책이니, 이래도 되겠죠.
--------------------
1963년 10월. 호랑이가 가끔 나오곤 했다던, 작은 개천이 흐르는 부산 범천동에 4층짜리 높은 건물이 들어섰다. 그리고 안영모라는 젊은이가 아내의 손을 잡고 돌이 갓 지난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이 건물에 이사를 왔다. ‘범천의원’. 동네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문을 연 동네 최초의 병원이었다. 가장 높은 게 당연했다. 동네에는 자그만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거리는 데 익숙했으며, 그러다보니 병을 키우는 일도 많았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수두룩했고, 가끔 먹을 게 생기면 급히 먹다가 체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병원이 생기자 병이 생겨도 갈 곳이 없던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루에 환자가 100명이 넘는 날도 많았다. 밤이면 응급환자가 생기게 마련이었고, 젊은 의사는 몇 차례고 문을 두드리는 환자 보호자를 따라 왕진가방을 손에 든 채 판자촌을 헤매고 다녀야 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젊은 의사의 큰 아들은 의대를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을 벌였고, 손녀를 안겨줬다. 작은 아들은 한의대에 진학했다.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젊은 의사는 어느새 낯익은 동네 할아버지가 됐고, 동네에서 가장 높았던 병원은 인근의 고층 건물에 묻힌 고만고만한 작은 건물로 변했다. 하지만 으리으리한 병원이 많은 부산시내에서 이름 없는 작은 의원에 불과한 이 할아버지의 작은 의원에는 요즘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환자를 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돋보기 없이는 가까운 곳을 잘 보기도 힘든 할아버지 원장님이지만, 아직도 구멍가게 할머니, 만물상 할아버지들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고집한다. 조금 전까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구르던 아이도 엄마가 손을 덥혀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주면 복통은 쉽게 멎게 마련이다. 신뢰 때문이다. 엄마가 만져주면 낫는다는 믿음, 그것이 병을 고치는 가장 큰 약이었다. 젊은 의사 안영모는 일흔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함께 나이를 먹으며 동네를 지켜온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눈빛과 손길에 병이 낫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병원을 그만 두고 남은 인생을 편히 쉬며 보낼 때,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입 속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지그시 환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한 마디 건넨다. “좋아지실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병원 문을 하루라도 닫고 쉴 때면 놀라서 집으로 찾아온다. “선생님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계속 진찰해 주실 거죠?” 그는 아파도 쉬지 못한다. 그의 아들 이름은 철수다.